Posted on 2008. 11. 12.
부패와 민주주의
윤 진 표 교수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국민의 정치적 참여와 자유로운 선거 경쟁이 보장되는 민주주의가 부패문제를 자동으로 해결해 주지는 않는 것 같다.
우리나라가 민주화의 문턱을 넘은 1987년 6월 항쟁이후 지금까지 5명의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뽑고, 국회의원 선거에 지방선거까지 꼬박 치르고 있지만 공직자의 부패와 부정 문제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국제투명성기구(the 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발표한 2008년 부패인식지수(CPI)에 따르면 한국의 부패도는 세계 40위 수준으로 (5.6점; 1~10점 사이에서 10점에 가까울수록 부패가 없음) 별로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부패와 민주주의는 별개라는 인식은 동남아시아의 두 나라를 비교해 보면 더욱 분명해 진다.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는 서로 마주보는 지척의 거리에 있는 가까운 동남아의 두 나라다.
한국의 서울만한 크기의 싱가포르는 세계 최고수준의 국가경쟁력을 갖춘 작지만 강한 나라의 대표 사례로 꼽힌다.
또한 싱가포르는 부패 없는 깨끗한 나라로 정평이 나있다. 2008년 부패인식지수도 세계4위(9.2점)로 세계에서 가장 부패가 없는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
1965년 독립한 싱가포르는 민주주의 체제에서 총리였던 리콴유의 리더십과 관료의 능률성을 바탕으로 성장한 나라이다. 권위주의적 요소로 인해 비판받는 측면이 없지 않지만 작은 섬나라의 국가생존을 위해서 강한 국가중심의 부패 없는 능률적 행정을 지향해야 한다는 주장에서는 조금의 양보도 없는 나라다.
반면 인도네시아는 126위(2.6점)로 세계에서 가장 부패한 나라 중 하나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32년이나 지배했던 권위주의적 수하르토 대통령이 1998년 경제위기와 국민의 민주화 요구로 하야한 이후 지금까지 4명의 대통령을 거치면서 민주화 조치를 상당히 진전시켜 왔다.
그렇지만 구조적인 부패 문제는 오히려 과거보다 더해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예를 들면 과거 수하르토 대통령 시절에는 중앙의 강력한 실권자에게만 뇌물을 주면 알아서 아래까지 다 해결이 되었지만 이제는 하위 관리와 동네 경찰부터 최고위직 관료까지 모두 다 뇌물을 주어야만 사업이 되는 지경이 되었다고 한다. 민주화가 부패의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 버렸다고 냉소적으로 말하고 있다.
결국 부패 문제는 민주주의 수준과는 별도로 각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부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당근과 채찍을 겸비한 제도적인 확립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지만 이에 못지않게 최고 지도자의 강력한 부패 일소 의지와 지속적인 관심이 있어야만 부패는 조금씩 해소되기 시작한다.
싱가포르는 공무원이 부패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공무원 급여수준을 가장 잘 나가는 민간기업 급여의 80% 정도로 맞춰준다. 나머지 20%는 국가공무원이라는 긍지로 충분히 보상된다고 말한다.
여기에 더해 리콴유의 지독할 정도의 반부패 혐오감과 총리실 직속 반부패조사기구의 강력한 사찰 활동이 싱가포르를 세계에서 가장 깨끗하고 경쟁력 있는 관료를 갖고 있는 나라로 만든 힘이다.
인도네시아의 사례는 민주화가 진전되고 있는 나라라 해도 부패가 오히려 더 고질화 되는 현상은 부패 해소를 정치지도자의 최고 의제로 설정하고 뼈를 깎는 각고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결코 이루어 질 수 없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우리나라의 민주화의 역사가 이미 20년을 지났지만 공직자의 부패와 이와 관련된 사회전반의 부조리 문제는 여전히 신문 지상을 수놓는 단골 메뉴이다.
민주주의가 확대되어 선거가 정기적으로 치러지고 대통령과 국회의원과 도지사가 교체된다고 해서 부패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부패는 민주주의 제도의 느슨함을 숙주로 하는 기생충과 같다. 부패는 민주주의를 뿌리에서 썩어가게 한다. 부패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갈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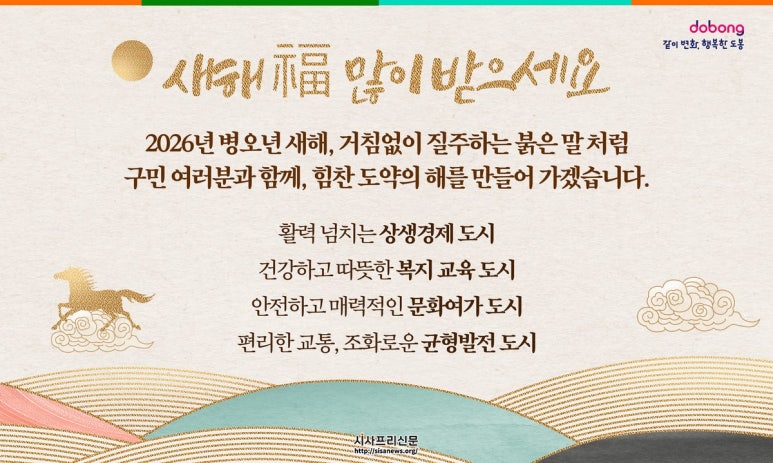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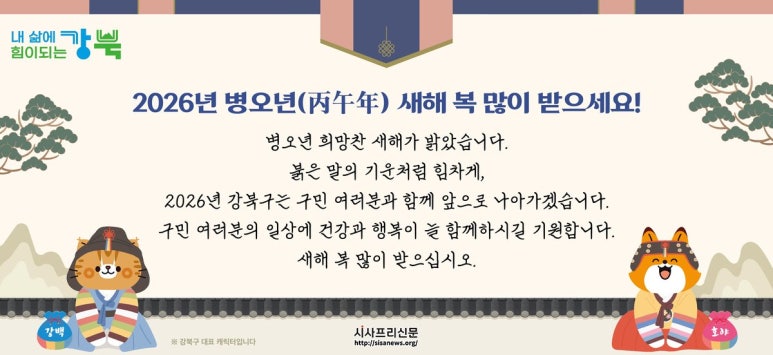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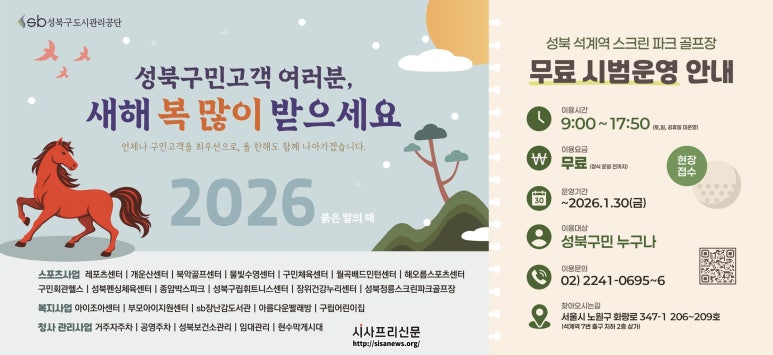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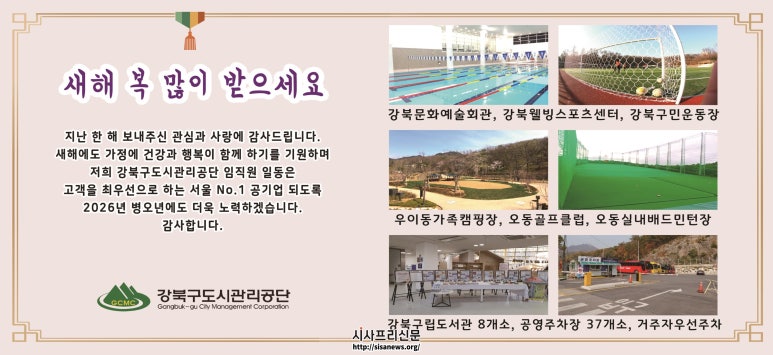
.jpg?type=w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