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08. 11. 19.
교육격차 해소정책이 오히려 교육격차 늘려서야
서울시의회 오신환의원, 서울시교육청 질타

서울시교육청에서 추진 중인 교육격차 해소 정책이 오히려 교육격차를 벌리는 구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의회 오신환 의원(한나라당, 관악1, 교육문화위원회)은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좋은학교만들기 자원학교사업’과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의 현황을 분석한 가운데 이 두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의 대표적인 교육격차 해소 사업인 ‘좋은학교만들기 자원학교사업’은 교육 여건 및 지역 여건이 열악하고, 학업 성취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학교 중 특히, 학교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학교발전 의지가 높은 학교를 선정해 행·재정적으로 집중 지원하는 제도이다.
그리고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은 교육문화적 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도시 저소득층 밀집 지역의 교육 및 문화적 기회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문제는 이러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사업이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우수한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먼저 ‘좋은학교만들기 자원학교사업’은 지난 3년간(2006~2008) 총 189학교에 지원됐는 바, 자치구별로 보면 교육환경이 우수하고 서울에서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중구(86%)에는 8개교에 지원된데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환경이 열악하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도봉구(35.3%)에는 오히려 4개교에만 지원됐다.
또한 재정자립도가 44.6%에 불과한 광진구에는 3개교, 재정자립도가 43.4%에 불과한 동작구에도 5개교에만 지원돼, ‘좋은학교만들기 자원학교’ 사업의 학교선정에 일관성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재정 지원하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의 경우는 더 심각해 보인다.
금년에 선정된 학교는 총 69개교로 자치구별 현황을 살펴보면, 강남구의 경우에는 4개교가 지원된데 비해, 도봉구에는 2개교, 성북구에는 초등학교 1곳에만 지원됐고,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동대문구, 마포구, 서초구, 서대문구, 송파구, 양천구, 용산구, 중구 등 25개 자치구 중 12곳은 아예 1곳도 선정되지 못했다.
이러한 가운데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학교로 선정된 학교 중에 ‘좋은학교만들기 자원학교’로 중복 선정된 학교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오신환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좋은학교만들기 자원학교’로 선정된 189학교 가운데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학교로 중복 지정된 학교는 무려 41교에 달하고 있다.
이 점에 대해 교육청관계자는 “중복으로 지정된 학교는 학교환경이 매우 열악한 학교”라고 밝히고 있지만, 실제로 교육청의 지원이 부족해 교육혜택으로부터 소외되고 있는 열악한 학교가 상당히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열악한 학교’에 대한 기준도 모호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가능한 많은 학교에 지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학교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학교선정에 있어서 모순이 발생한 원인 중의 하나는 선정방법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교육격차 해소 사업의 선정은 일단 지원한 학교 중에서 선정을 하게 된다.
즉, 아무리 열악한 교육환경에 처해 있다하더라도 해당학교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선정될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서 문제는 현재 많은 학교에서 프로그램 연구활동에 대해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다는 점이며, 특히 교육환경이 열악한 학교의 경우일수록 교사들의 기본교육과정이외의 과외 교육활동에 부정적이라는 점이다.
이것은 결국 교육행정기관의 행·재정적 지원으로부터 소외되는 결과를 초래해 교육환경이 안 좋은 학교는 더욱 열악해지고, 반대로 교육환경이 좋은 학교는 더욱 우수해지는 교육환경 부익부빈익빈 현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오신환 의원은 “현재와 같이 학교가 신청하는 방식으로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교육당국이 재정자립도가 열악하거나 기초생활수급자 밀집지역 등에 위치한 학교들을 의무적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또한 “해당학교 교사들에게 부여하는 가산점이나 인센티브 제도를 더욱 확대함으로써 참여도를 높이는 방법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당국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 중인 교육격차 해소 대책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전반적인 시스템의 재점검을 통하여 문제점을 보완하고, 교육격차 해소 대책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새로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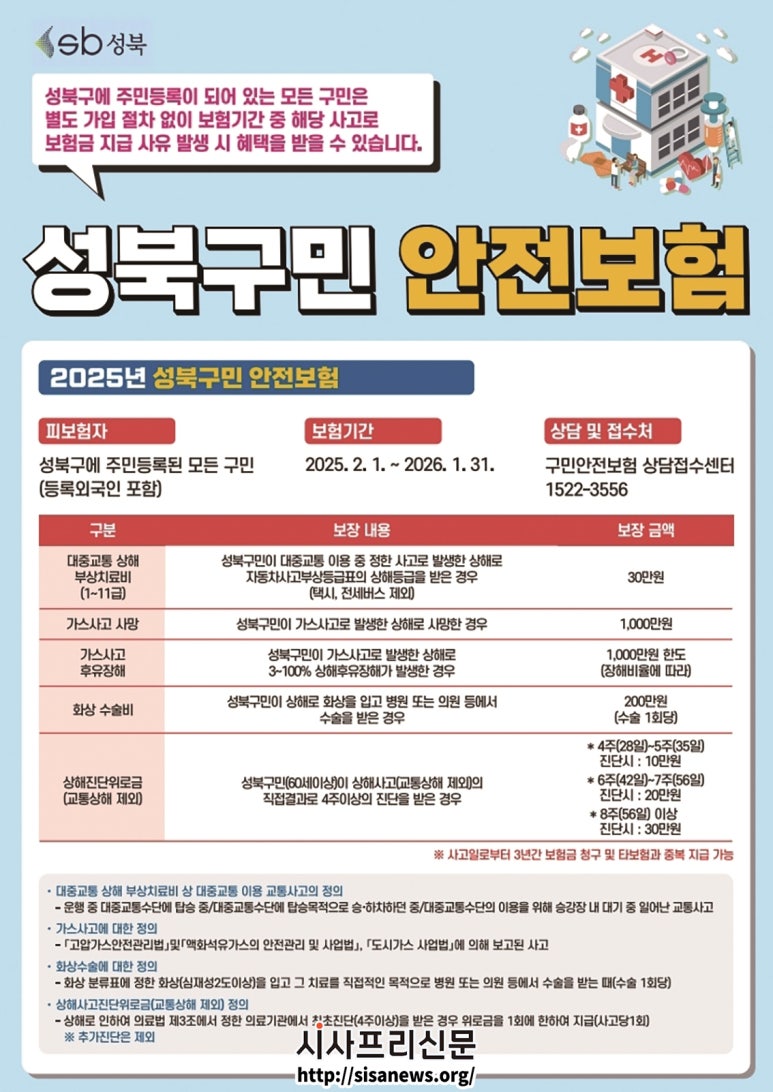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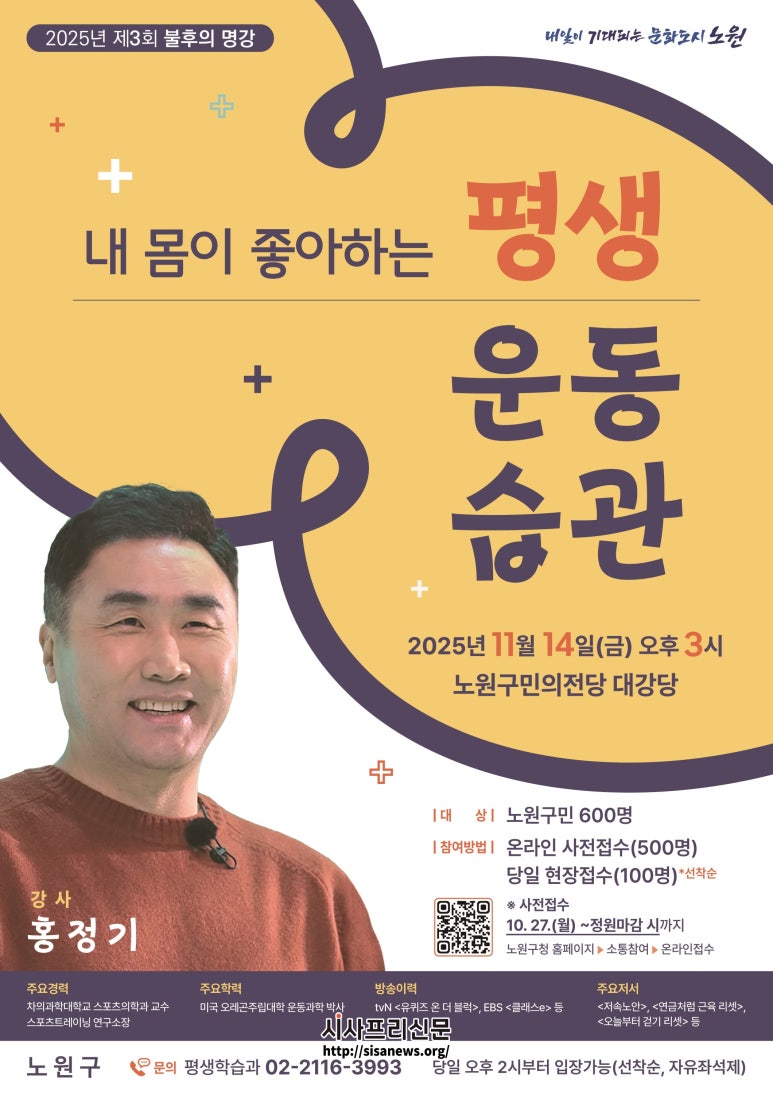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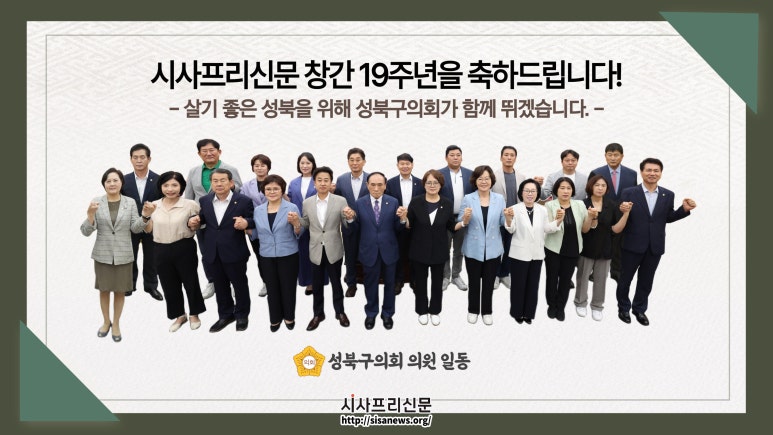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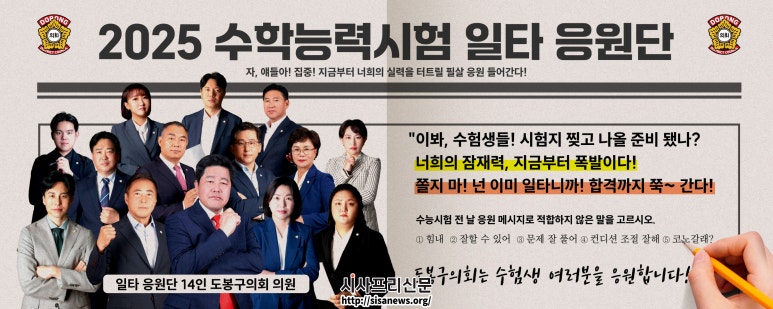




.jpg?type=w7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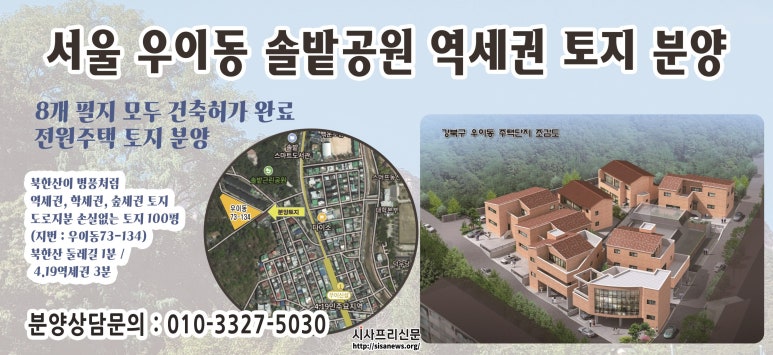
.jpg?type=w7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