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1. 01. 19.
KAIST 학생 자살 사건으로 본 현 교육제도의 문제점
대학생 기자 김 가 영
지난 10일 KAIST의 한 학생이 오토바이 위에 쓰러진 채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공고 출신으로 KAIST에 합격해 주목을 받았던 그 학생은 입학한지 1년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밝혀져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조 군은 이번 학기에 일부 과목에 대해 낙제점을 받은 데다 평소에도 좋지 않은 성적 때문에 고민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군은 공고 출신 중 최초로 KAIST 입학사정관 전형을 통과해 수차례 매스컴에 보도되는 등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고 입학했지만, 막상 입학하고 난 후에는 학교 수업에 적응하지 못하고 따라가기 힘들어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극단적인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일로 대학입시, 그 중에서도 입학사정관제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되었다.
KAIST 입학사정관제로 과학고가 아닌 기타 고등학교 출신의 학생을 뽑는다는 취지는 좋지만, 입학사정관제로 뽑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제도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학생만 뽑은 것 같아 학교도 이번 사건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과학고와 일반고, 전문계열 고등학교는 학교 커리큘럼이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학생이 입학을 하게 되더라도 강의를 따라가기 힘든 것이 당연하다. KAIST는 국어, 국사 등의 극히 일부 과목을 제외한 모든 과목을 영어로 강의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 어려움은 더 컸을 것이다.
KAIST 관계자는 현재 입학 전 사전교육 프로그램인 ‘브리지 프로그램’ 등 입학사정관제 전형으로 합격한 일반계 및 실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런 제도가 먼저 도입되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좋은 취지로 실시한 제도인데 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인재 한명을 잃은 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이다.
이번 사건을 통해 볼 때, 인문계, 전문계열 고등학교 출신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무작정 기회를 주기 보다는 이런 기초적인 부분부터 해결을 보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싶다. 특히, 2012년 대학 입시에서는 입학사정관제를 시행하는 학교가 기존 118개 대학 3만6896명에서 122개 대학 4만1250명으로 늘어난 만큼 입학사정관제의 중요도는 해를 거듭할수록 더 커지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에 발맞춰 각 학교에서는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에 대비해야 하는 것은 물론, 입학사정관제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이며, 어떻게 대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바람직한지 학생과 학부모에게 설명해주는 강연회 등의 기회를 늘려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교육부는 매년 지나치게 복잡한 교육정책을 내놓고 있다. 심지어 그 정책이 해마다 바뀌어 학생과 학부모에게 내년에 또 바뀌게 될 것이라는 불안감에 살게 하고 있다.
교육정책을 놓고 매번 충동하는 모습만 보일 것이 아니라, 보다 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누구보다 우리나라 학생을 위한 교육정책이 마련되어 애초에 밝혔던 좋은 취지를 살렸으면 하는 바람이다.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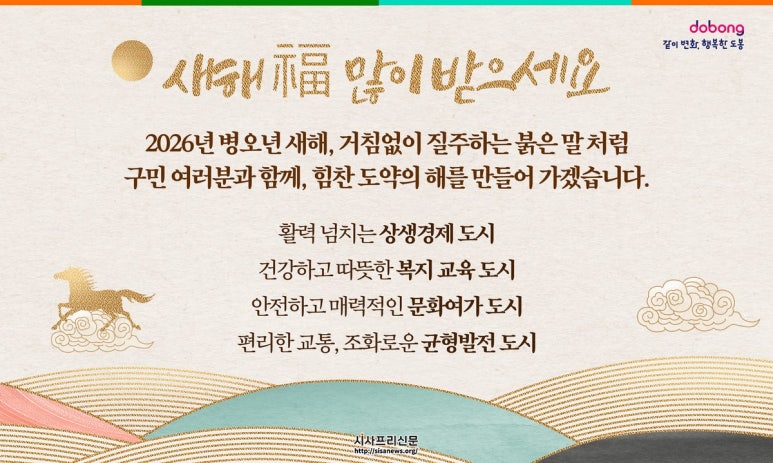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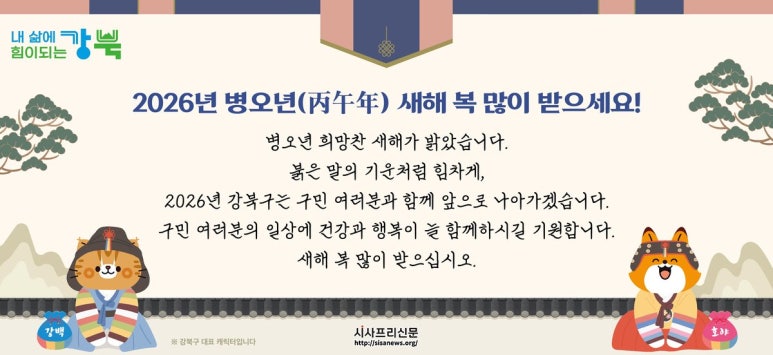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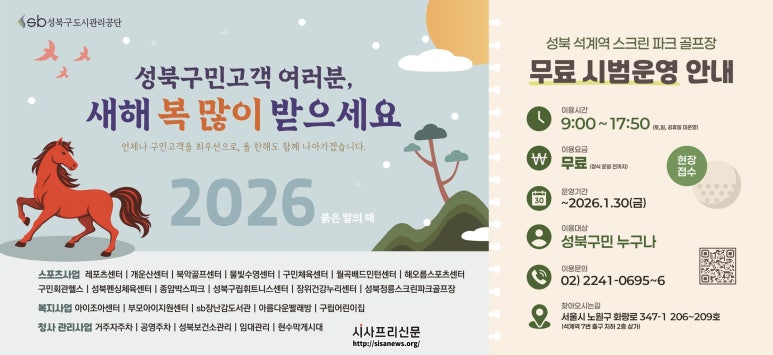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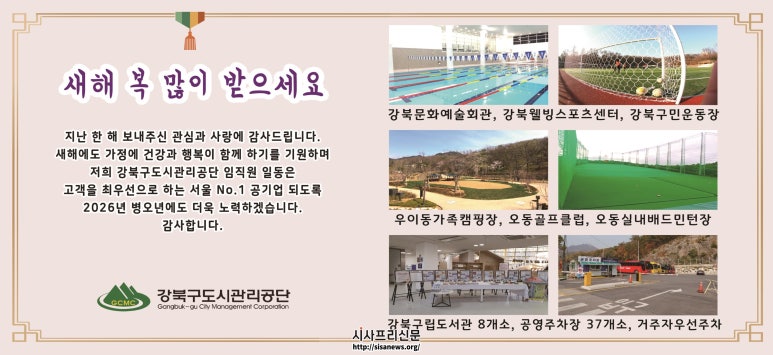
.jpg?type=w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