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1. 06. 17.
소모성 자재구매 대행 사업에 관한 논쟁
전 윤 종 기자
요즘 돌아가고 있는 분위기를 보면 한국시장은 이제 완벽한 자유경쟁의 시장이 된 듯하다.
그런데 그 자유경쟁이라는 의미가 좋은 쪽으로만 해석되는 것 같지는 않다.
어떠한 사업이던지 지금은 어느 업종을 가리지 않고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 한쪽에서는 이른바 신 성장 동력이라고 말하면서 기존에 이미 형성이 돼있는 시장에 진입을 하고 있고 반대편에서는 이 시장은 그들이 힘겹게 쌓아 올린 영역이니 침범해서는 안된다고 강력히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다들 알 수 있듯이 시장 진입을 시도하고 있는 쪽은 대기업이고 그들의 진입을 반대하고 있는 쪽은 중소기업이다.
그간 중소기업들이 기반을 다져놓은 업종에 대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했고 벌써 적지 않은 수의 중소기업은 이와 같은 대기업과 경쟁에서 제대로 힘도 못써보고 시장에서 도태되기 시작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달 27일까지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청을 받았는데 무려 234개의 업종을 신청 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수치는 70~80여개의 업종에서 적합신청을 할 것이라는 당초의 예상을 크게 벗어난 것이었고 소비재와 뿌리산업 등 다양한 업종이 포함됐다.
접수된 품목을 보면 두부나 막걸리, 레미콘, LED등 그동안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의 진입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업종들이 대부분 접수가 됐다고 한다.
이 와중에 대기업이 진행하고 있는 소모성 자재구매 대행(MRO)사업도 역시 문제가 되고 있다. MRO란 maintenance, repair and operation의 약자로 공구와 베어링, 사무용품 등 기업 활동에 들어가는 소모성 자재 구매를 대행해 주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이제껏 중소 유통 상인들이 이끌어 오던 부분이었는데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대기업이 진입하면서부터 상황은 급변했다.
먼저 시장 규모를 보면 2001년 3조7821억원이었던 것이 2007년에 들어서 20조4000억원으로 초고속 성장을 했는데 발생한 과실을 대기업이 독차지해가는 문제가 생겼다.
중소 상인들은 그동안 대기업에 납품을 하며 수익을 얻고 있었는데 이렇게 대기업이 가세하면서 납품단가가 3∼7% 떨어진 상황이라고 언급했고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 계열의 MRO 회사에서 수수료까지 챙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게다가 대기업 계열 MRO 회사가 사업의 영역을 확장시켜 1∼2차 협력업체와 정부 공공조달 시장에까지 진입을 하자 갈등은 극으로 치닫게 되었고 이에 소상공인들로 구성된 MRO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지난 9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유통분야 중소기업 적합업종 심사에 조속히 착수해 MRO 분야를 적합업종으로 선정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15일쯤 동반성장위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지금의 갈등이 봉합이 되지 않을 경우 MRO사업을 진행중인 대기업의 물품에 대해 불매 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연간 총 104조4000억원에 이르는 공공조달 시장에서 사실상 대기업 MRO들을 배제할 방침이라고 언급했고 행정안전부에 이어 지식경제부도 이날 MRO를 중소기업을 통해서만 구매하도록 60개 산하기관 등에 지시하면서 중소 상인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공정한 경쟁은 서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자극제가 되겠지만 지금의 현실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놓지 못했다. 기업의 이윤추구야 당연한 목표이겠지만 그것이 너무 노골적이면 반감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지했으면 좋겠다.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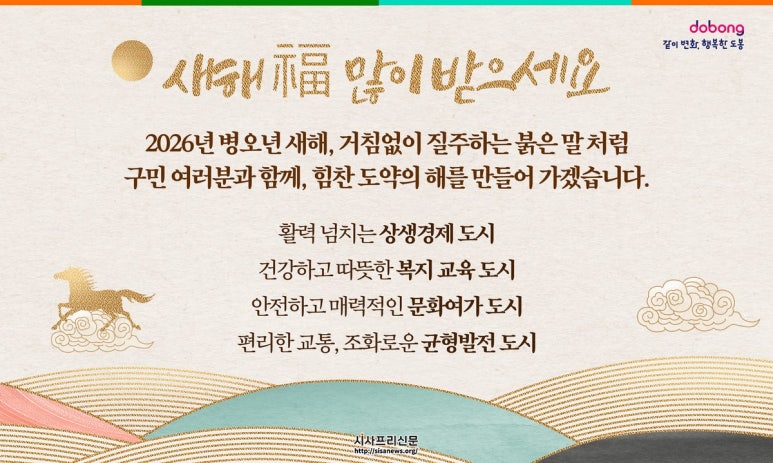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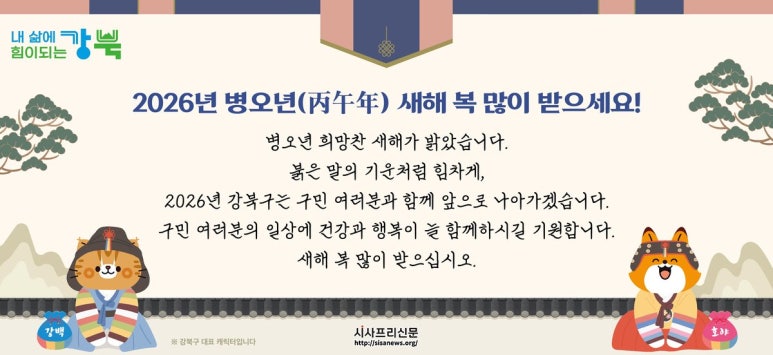






.jpg?type=w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