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1. 09. 19.
지리산 대성골 ‘그집’
김 세 현
행정학박사 / 호원대겸임교수
지난 9일에 지인들과 지리산 자락에 다녀왔다. 여름휴가도 가지 못해서 단순히 1박2일 동안 일상탈출이라는 생각으로 얼떨결에 출발했지만 민족의 명산인 지리산에 대한 막연한 설레임 같은 것도 간직한 채 여행을 떠났다.
점심은 전주에 들러 모주를 곁들인 비빔밥을 맛있게 먹고 하동 의신마을에 도착하니 어스름해지기 시작했다. 출발 전에 목적지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어 그냥 등산로 초입에 있는 팬션에서 하루 쉬고 오나 했더니 약 2km를 산에 올라야 한다고 한다. 1시간가량 걸으니 산장이 보였다. 산장이라기보다 그냥 시골집이라는 표현이 나을 듯 보였다. 우선 계곡에서 몸을 씻고 산장지기가 내놓은 막걸리에 목을 축이고 일행은 오랜만에 마음 놓고 술잔을 기울였다.
산장지기가 따라주는 시원한 막걸리 두어 잔에 소주 몇 잔을 더 곁들이니 취기가 오르고 우리 일행 말고는 아무도 없다는 생각에 노래도 몇 곡 곁들이면서 한껏 흥을 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아침에 깨어보니 상당량의 소주병이 뒹굴고 있어 “저 술을 우리가 다 마셨나”라는 생각에 머리를 흔들어 보았다. 평소 저 정도 마시면 머리도 좀 아파야 할진데 신기할 정도로 멀쩡했다. 수건 한 장을 들고 계곡에 가보니 웬 신선이 물속 바위에 앉아 있었다. 우선 계곡에 몸을 깨끗이 씻은 후 그 신선과 대화를 시작했다.
어젯밤에 노래 부른 이가 당신이냐고 물어 오기에 그렇다고 하니 산에서는 밤에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산에서 밤에 노래를 부르면 산천초목도 싫어하고 산짐승들도 놀래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한다. 그럼 어젯밤에 말씀하시지 왜 이제야 얘기 하냐고 했더니 자기는 이산저산 명산을 다녀보아 산에 대해 잘 알지만 보아하니 산에서 처음 밤을 맞는 사람으로 보이고 흥이 난 것으로 보여 그냥 두었다고 한다. 물론 신선은 다름 아닌 우리 일행 중의 한사람이었다. 그렇구나.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남을 가르치던 사람이 산의 주인은 사람이 아닌 산천초목과 산 짐승인데 그들의 존재를 까맣게 잊은 채 내 기분만 냈던 것을 생각하니 염치없기 짝이 없었다.
“올까 말까 고민했는데 참 잘 왔구나”라는 생각도 들었다. 평소 산에 대해 잘 알지도 모른 채 그저 건강만 생각해서 산에 가면 그저 빠른속도로 오르내리며 땀만 흘렸지 “이산에 누가 사는지, 나무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이 산의 내력은 어떤지 등등 기본적인 것도 알려고 하지 않은 채 그냥 지나친 것이다.” 주인이 엄연히 있는데 주인에게 물어도 안 보고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것도 모자라 야밤에 노래까지 지껄이는 무례라니, 이 어찌 산에 대해 큰 실례가 아닌가?
늦게라도 지리산을 지키는 대성골 산장지기에게라도 산에 대한 실례를 사과해야겠다고 그를 찾아보니 벌써 산 밑에 물건을 가지러 내려갔다고 한다. 산장지기 형수가 잘 차려준 아침을 먹고 산을 내려오다 큰 지게에 물건을 가득지고 올라오는 산장지기를 만났다. 반갑게 인사를 하니 “마을에 있는 자기집에 막걸리를 준비해놨으니 한잔 하고 가란다.”
지리산에서 캤다는 더덕에 곁들여 막걸리 한잔 또 들이켜고 서울로 오면서 지리산을 다시 올려다보았다.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가 끝인지, 정상이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어린시절을 이런 곳에서 보낸 사람들은 뭔가 남다르겠다는 생각을 하며 산만 바라보며 서울로 올라왔다.
복잡한 일상을 떠나 아무 생각없이 찾은 지리산자락에서 보이는 것들이 아무생각이 없어 보이지만 그들은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말을 하지 않고 고개를 돌리거나 그냥 지켜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 지리산과 산장지기 대성에게 새삼 고맙고 여행을 제안한 지인에게도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
지리산 계곡을 흐르는 물보다 더 맑고 깨끗한 청년 남성 부부와 예쁜 아이 세윤이, 그리고 그의 형과 형수의 얼굴이 스쳐간다. 짧았지만 긴 여운을 가진 여행, 이런 여행이라면 자주 가고 싶다. 사방에 스승이 있고 우리가 모르는 신선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라도.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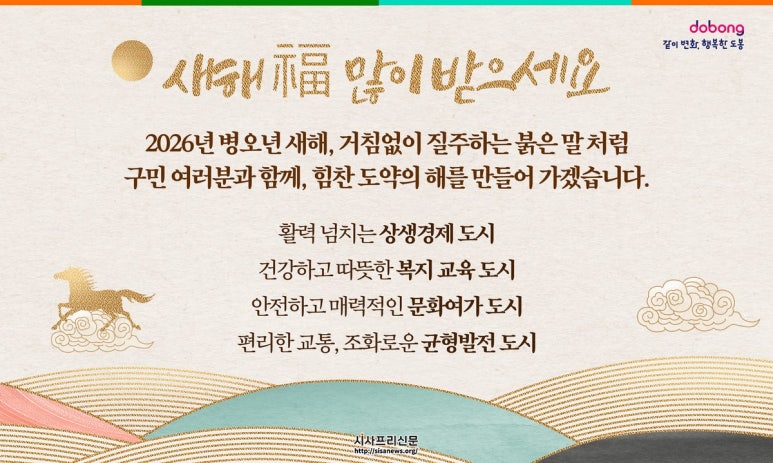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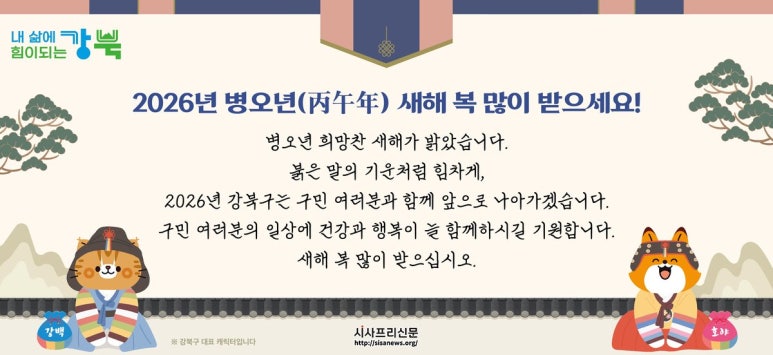






.jpg?type=w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