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2. 12. 18.
누구를 위한 입양특례법인가
정부가 입양아동 권리를 보호하자는 취지로 지난 8월부터 ‘입양특례법’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같은 법 개정이 오히려 입양을 막고 있는 듯 하다. 아이를 입양시설에 보내기 위해서는 친모의 신상을 공개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아이를 입양하기 위해서는 재판을 통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입양 과정에서 친모나 양부모 모두 신분이 노출되는 등 부담만 늘어나 양측에서 오히려 입양을 기피하게 된 셈이다.
국내 최대 입양기관인 홀트아동복지회에 따르면, 입양특레법 시행 후 복지회에 맡기는 아이 숫자가 절반 이하로 줄었다고 한다. 특례법 시행 전인 올해 8월 이전까지 홀트아동복지회에 맡겨진 아이는 월평균 66명이었다. 하지만 특례법이 시행된 8월에는 33명으로 줄었다. 그 이후로도 8월부터 11월까지 복지회에 들어온 입양 의뢰 아이는 월평균 34명에 불과했다.
또한, 관계자에 따르면, 특례법 시행 직전인 7월 입양 의뢰가 120건까지 치솟는 등 활성화가 되었는데, 법률 개정 후는 이 수치가 반도 안되는 숫자로 떨어진 것이다. 신분노출을 피하고 싶은 양부모들의 거부감을 단적으로 나타낸 수치다.
뿐만 아니라 특례법 시행 이후 새 부모를 찾는 아이들 숫자 또한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지경으로 급감했다. 8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입앙돼 나간 아이는 단 두명에 불과하다고 한다.
입양이 아직 많이 활성화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입양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라 오히려 입양이 감소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물론 입양아의 권리를 보호하고, 가족의 해체를 막겠다는 법안 취지에는 공감한다. 어찌보면 물건을 사고 파는 것도 아니고, 한 아이를 입양보내는 과정이 그동안 너무 허술했다는 점에서 법안 개정이 어느정도 납득이 간다. 그 동안에는 당사자간의 합의만으로 너무 쉽게 입양이 이루어졌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와같은 개선법으로 인해 신분노출을 꺼려하는 미혼모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입양 자체를 기피하고 있다는 점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아이를 유기해 숨지게 만드는 비극적인 사건들까지 발생하고 있다. 혹은 공식적인 입양기관을 찾기 부담워 ‘베이비박스’가 유행을 타고 있다고 한다. ‘베이비박스’란 서울 한 교회에서 마련한 상자로, 아무런 조건 없이 아이들을 받아주는 곳이다. 이 곳에서는 신분을 밝힐 필요도 없고, 교회 관계자와 만날 필요도 없기에 새로 바뀐 입양절차가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고 한다. 입양특례법 개정으로 인해 요새는 하루 평균 한두명이 찾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이곳을 찾고 있다.
입양아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입양이 되지 않은 아이의 경우 평생 미혼부모의 가족관계부에 등재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는 경우 아이의 권리또한 보호할 수 없고 친모의 권리 또한 보호할 수 없다. 미혼모의 인권 측면에서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점이 많은 듯 싶다. 아이를 낳고난 후 키울 여건이 되지않은다는 이유로 내다버리는 친모의 태도가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나, 불필요하게 과도한 절차로 인해 입양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것 또한 문제라 본다. 보다 합리적으로 법안이 개선되어 입양이 활성화 될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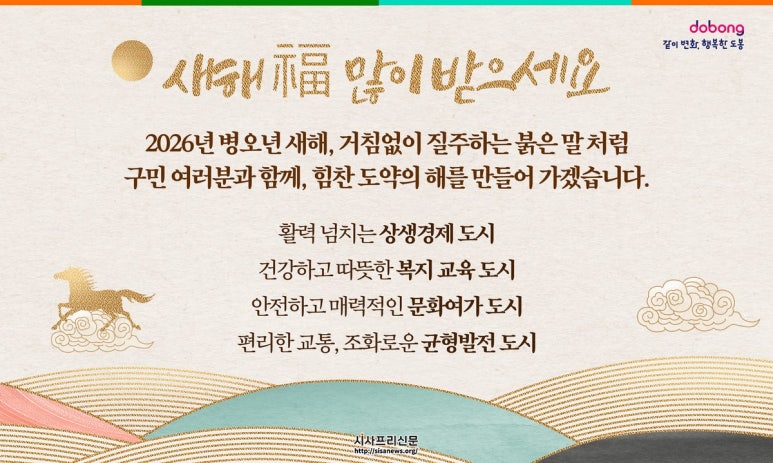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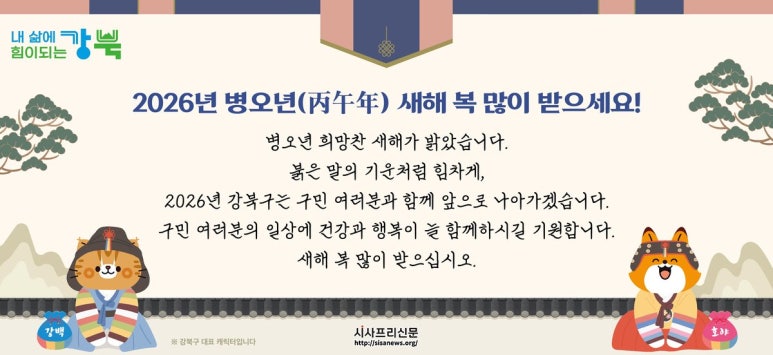






.jpg?type=w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