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3. 05. 07.
60세 정년 시대
국회가 지난 30일, 오는 2016년부터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내용의 일명 ‘정년60세 연장법’을 가결했다. 이로서 한국 사회는 곧 ‘60세 정년 시대’를 맞게 됐다. 정년 60세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적용되며 이듬해인 2017년 1월 1일부터는 국가 및 지자체, 30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된 뒤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세대별 시각은 매우 다른듯 하다.
평균수명이 늘며 이는 고령화에 따른 당연한 수순이라는 시각이 있는 반면, 이로 인해 신규 채용이 줄어 청년실업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 또한 많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정부와 노동계는 청년 일자리와 50대의 일자리가 ‘대체 관계’가 아닌 ‘보완 관계’라며 이런 우려를 일축하고 있지만, 사실상 정년퇴직이 늦춰지면 청년의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 질 수 밖에 없다.
경험과 경륜을 갖춘 근로자들의 정년이 늘어나면 물론 도움이 되는 면이 있겠지만, 기업 측에서 부담이 적지 않을 수 없다. 특히나 재계는 신입사원과 50대 직원의 연봉 차이를 들며 청년 신규 채용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 성장이 정체되어가는 가운데 경기침체까 가속화되고 있기에 정년이 늘어나면 아무래도 기업은 신규채용을 줄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정년제도란 근로자가 장기간 근속하거나 노령이 되어 업무처리능력이 사회통념상 급격히 저하된다고 여겨지는 연령에 도달하면 자동적으로 퇴직하게 하는 제도다. 우리나라 정년 제도는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보호 장치 성격이 강하다. 기업들이 정년 연장은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기업 운영을 어렵게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 국가에서 강제로 정년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정년 60세 연장법에 대한 우려가 반증하듯, 고용보호 장치 성격의 정년제도가 긍정적인 영향만 끼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미국이나 영국같은 나라는 정년을 설정하는 것 자체가 고령자 차별로 판단헤 정년제도를 금지하고 있기도 하고, 일자리 창출에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고령화시대에 맞춰 정년을 늘리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는 것은 마땅한 조치나, 청년실업이 우려되지 않도록 다른 조치도 함께 동반되어야 한다.
그 예로, 임금피크제가 있다. 임금피크제란 워크 셰어링의 한 형태로, 일정 연령이 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까지 고요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임금피크제 도입이나 탄력근무제 도입 등 대안이 받쳐주지 않는다면 정년이 보장된다 한들 청년실업문제 해결엔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청년 실업문제가 이렇게 심각한 가운데 딱히 뾰족한 대안 없이 정년연장 카드를 내밀기에는 ‘정년 60세 연장법’은 약간 성급한 조치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다. 정부와 기업체는 정년 연장과 청년 취업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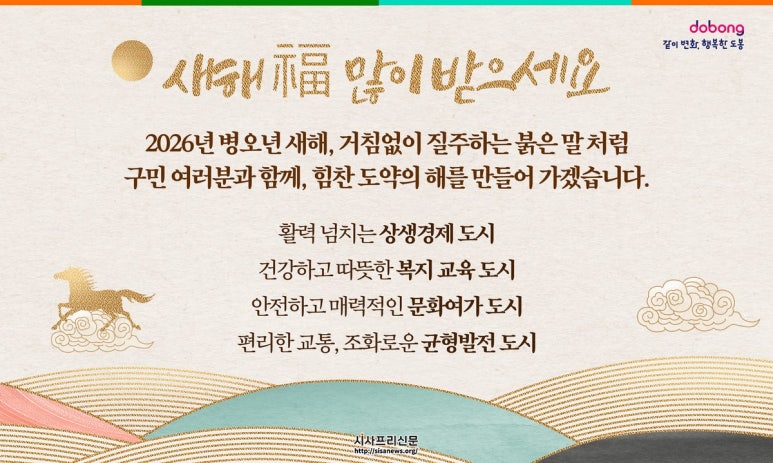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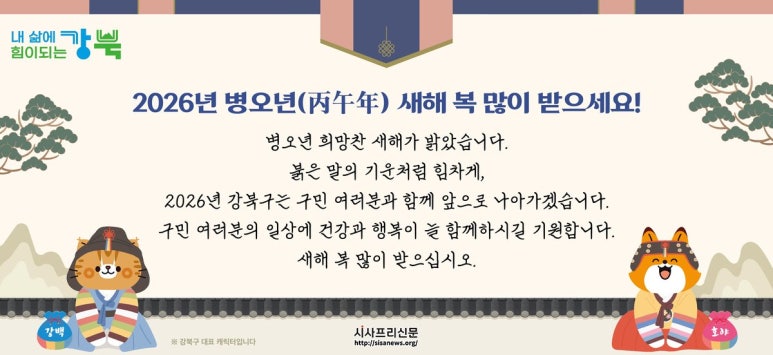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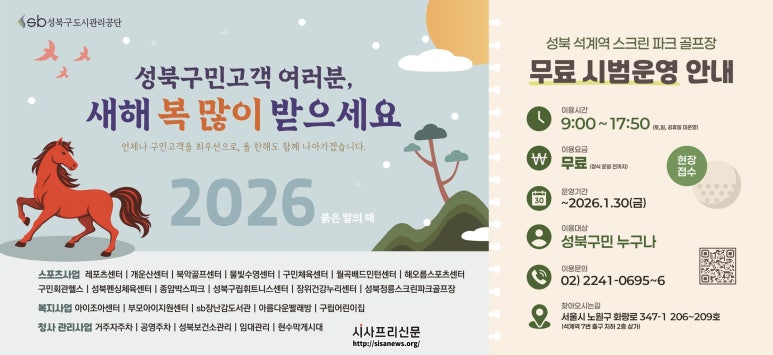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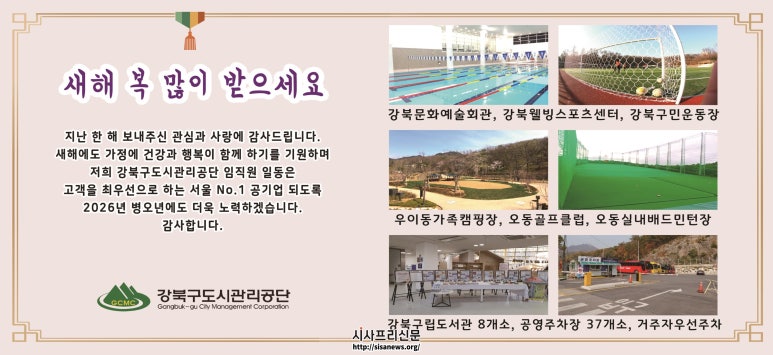
.jpg?type=w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