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1. 02. 24.
지방자치(治,) 아직은 요원한 의료격차 해소 방안에 대하여

▲김일영(성북구의회 의장)
바야흐로 지방자치의 시대다. 지난 연말 이루어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필두로 지방은 지방자치의 길에 훌쩍 다가섰다. 이제 주민은 직접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으며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자치단체는 종전보다 더욱 강화된 자치입법권을, 지방의회는 정책 지원인력 도입으로 한층 높아진 전문성을 갖는다. 갈 길이야 아직도 멀지만 지방이 스스로를 다스린다는 본뜻에는 점점 더 다가가고 있는 모습이다.
하지만 다른 의미에서는 어떨까. 다스릴 치(治)는 병을 다스리고 고친다는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과연 의료 분야에서도 그만한 변화와 성과는 이루어지고 있는가? 지방이 지역주민의 의료를 적절하게 책임지고 있는가?
지난해 코로나 상황을 통해 점검해 본다면 답은 ‘아니오’다.
물론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질은 매우 높다. 코로나19 대확산 상황 속에서 소위 선진국이라는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는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공공의료기관을 필두로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코로나 환자의 80% 가까이를 전담하여 치료했다. 괄목할 만한 성과다.
문제되는 것은 그 다음이다.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규모는 OECD 평균과 비교했을 때 겨우 1/10에 지나지 않는다. 시도별 공공의료 병상비율은 최소 0%에서 최대 32%까지 이르는 등 그 격차가 몹시 크다. 이러한 실정이니 높은 의료 역량에도 불구하고 지역간 의료공급과 건강 수준의 불평등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위급한 상황일수록 지방의 환자는 수도권으로 바쁘게 핸들을 모는 현실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단 하나다. 적정 규모로 권역을 나누어 권역별로 공공의료를 확충하는 것이다. 오직 수도권으로만 양질의 공공의료가 편중되지 않고 산골도 어촌도 그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고육책도 필요하다. 의료시설 설립에 가장 큰 걸림돌인 예비타당성 평가 면제와 지자체 국가보조금의 차등 지원 등의 방책도 조심스럽게 고려대상에 넣어야 한다. 각 병원의 경영 자율권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이다.
마침 정부에서도 공공의료 확충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다행스러운 일이다. 지난 연말 발표한 “감염병 대응,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은 2025년까지 감염병과 중증응급에 대응할 수 있는 지방의료원 확대, 지역책임병원을 중심으로 한 필수의료체계 확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최종적으로 지역주민의 의료를 그 지역 내에서 완결짓는 의료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이 실현된다면 대한민국 국민은 어디에서나 소외되지 않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게 될 것이다. 이는 국민 건강 수준의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는 진정한 균형발전과 지방자치의 길에 더욱 큰 발자국이 될 것이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러한 정책과 의도가 방향을 잃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세심히 지켜보며 때로는 격려를, 때로는 매서운 비판을 보내야 한다는 점이다.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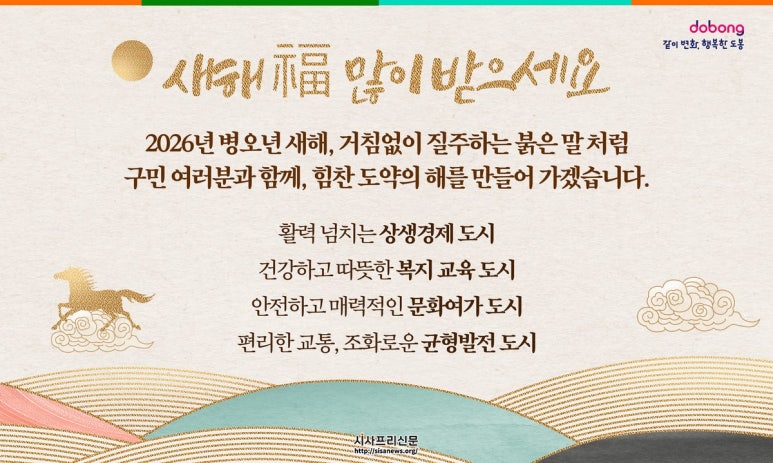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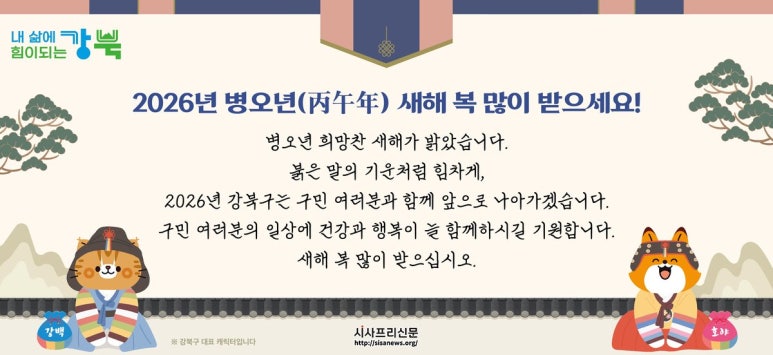






.jpg?type=w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