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1. 08. 25.
존중문화도시 도봉과 씨알이야기

▲민경찬 문화도시 추진단장
새로 이사를 온 집 뒤뜰에 작은 텃밭이 있었다. 함께 사는 네 명의 아이들과 함께 텃밭을 일구기로 했다. 먼저 거름을 뿌리고 묵은 땅을 갈아엎었다. 예쁘게 이랑도 만들고 정성스레 씨를 뿌렸다. 살짝 흙을 덮고, 흠뻑 물을 주고 나면, 이제 가장 어려운 일이 남아있다. 그것은 바로 ‘기다리는 일’이다. 다음 날 아침, 아이들은 싹이 올라왔나 보러 텃밭에 나갔다. 물론 싹은 나오지 않았다. 다음 날도, 그다음 날도 싹은 나오지 않았다. 기다리는 일은 정말이지, 너무나 힘든 일이다. 그러다가 기다림에 지쳐 이제는 기다리는 일을 포기했던 어느 날, 마당에서 갑자기 탄성이 터져 나왔다. “우와! 새싹이다!!” 우연히 뒤뜰에 나갔던 한 아이가 흙을 뚫고 올라온 작은 새싹들을 보고 탄성을 지른 것이다. 나가보니, 아주 작은 연둣빛 새싹들이 줄을 지어 올라와 있다. 아직 열매를 맺은 것도 아닌데, 그저 작고 연약한 싹일 뿐인데, 우리를 경탄하게 하는 생명의 신비가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다.
씨앗은 위로 자라지 않고, 먼저 아래로 자란다. 긴 시간 동안 땅 위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어두운 곳에서 생명이 일하고 있다. 먼저는 아래로 길게 뿌리를 내리고, 다음에는 옆으로 넓게 뿌리를 내린다. 그리고 작은 실뿌리가 충분히 뻗어서 땅속의 양분을 빨아들일 수 있을 때가 되었을 때, 그 힘으로 싹을 틔우고, 흙을 뚫고 위로 올라온다. 하지만 아직도 열매를 볼 수는 없다. 모든 소중한 것들이 그러하듯, 열매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꽤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모든 생명에는 그 생명의 진실(眞實)이 있다. 진실은 그 생명의 변하지 않는 본질이 겉으로 드러난 ‘열매’다. 그리고 그 진실은 ‘씨’ 안에 담겨 전해진다. ‘씨앗’만 보고는 그 생명의 진실을 알 수는 없다. 그 안에 감추어져 있어 볼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볼 수 없다고 해서 없는 것은 아니다. 지금은 비록 그 진실을 볼 수 없지만, 그 씨앗이 좋은 땅에 심기어지고 필요한 양분과 시간이 공급되면, 뿌리내리고 자라나 꽃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 씨앗 속에 감추어져 있는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사과 속의 씨앗은 셀 수 있어도, 씨앗 속의 사과는 셀 수 없다. 이 씨앗에 담긴 진실을 사람에 비유해서 설명한 분이 계시다. ‘씨ㅇㆍㄹ의 소리’로 유명한 함석헌 선생이다.
그는 ‘사람’을 ‘씨ㅇㆍㄹ’이라 부르자고 제안하며, 이렇게 설명을 덧붙인다. “‘씨ㅇㆍㄹ’이란 말은 ‘씨’라는 말과 ‘ㅇㆍㄹ’이라는 말을 한데 붙인 것입니다. 보통으로 하면 종자라는 뜻입니다. 순전한 우리 말로 하면 ‘씨앗’입니다. 그것을 밀려서 ‘민(民)’의 뜻으로 쓴 것입니다.” 그가 말한 ‘민(民)’은 ‘어머니에게서 난 그대로의 사람’, 즉 ‘지위도 직책도 없는 맨 사람’이다. 그는 일반 백성에 속하는 이 ‘씨ㅇㆍㄹ’들이 뿌리내리고 성장하는 것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허공에 뜬 나무도 없고 허공에 뜬 문화도 없다. 모든 식물은 땅이 피어난 것이듯이 모든 문화도 정신적인 흙이 피어난 것입니다…. (중략)…. 살고 난 결과가 흙입니다. 역사의 앙금이 다음 새 문화가 자라는 흙, 바탕이 됩니다.”
그의 말에 의하면 사람도 식물처럼 뿌리를 내리고 살아갈 정신적 토양이 필요한데, 그 토양은 다름 아닌 사람들이 만들어온 ‘문화’이다. 즉 씨ㅇㆍㄹ이 뿌리내리고 자라나 꽃 피우고 열매 맺을 토양은 다름 아닌 ‘사람’이라는 말이다. 사람은 씨앗인 동시에 그 씨앗이 자라는 토양이다. 그래서 ‘씨ㅇㆍㄹ’에게는 그가 살아가는 지역이 중요하고, 지역의 문화가 중요하며, 그 문화를 함께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중요하다. 그리고 사람들이 만들어 온 그 ‘문화’는 ‘이야기’를 통해 전해지고 이어진다.
함석헌 선생은 생의 마지막 시간을 도봉에서 보냈다. 그가 살던 집은 현재 ‘함석헌기념관’이 되어 그를 기억하고 기리는 많은 사람이 찾고 있다. 그가 뿌리내리고 마지막 생을 보냈던 도봉은 그가 그토록 외쳤던 ‘씨ㅇㆍㄹ’ 즉, ‘지위도 직책도 없는 맨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은 지역이다. 도드라지는 거목은 아닐지라도 마치 풀뿌리처럼 이 땅에 뿌리내리고 살아가며, 함께 마음을 모아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동네로 만들어가고, 죽어가는 곳은 되살리며 새롭게 바꾸어갔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하다.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들은 도봉의 문화가 되어 또 다른 ‘씨ㅇㆍㄹ’들이 뿌리내리고 성장할 토양이 되고 있다.
천년 된 방학동 은행나무를 지키기 위해 시작한 ‘은행나무 문화제’, 마을 숲을 지키기 위해 골프연습장 건립을 저지했던 ‘초안산 문화제’, 작은 도서관 운동의 역사 ‘초록나라 작은 도서관’, 마을의 폐허가 생태공동체로 탈바꿈한 ‘숲속애’, 분단과 대결의 상징에서 평화와 문화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고 있는 ‘평화문화진지’, 동네의 유해거리를 예술의 거리로 바꾼 ‘방학천문화예술거리’, 행정의 유휴공간을 주민들의 공간으로 바꾼 ‘도봉구민청’, 시대의 아픔에 동참하며 때마다 일어나 촛불을 들었던 촛불문화제와 기억문화제, 청소년들이 주도한 ‘평화의 소녀상’ 건립, 온 마을이 스승이자 학생인 ‘도봉마을학교’….
끝없이 이어지는 도봉 이야기들의 중심에 이 마을을 가꾸고 지켜왔던 ‘씨ㅇㆍㄹ’들이 있었다. 그리고 누구도 시키지 않았지만 함께 살아가는 지역의 문제를 누군가에게 내어 맡기지 않고, 스스로 주체가 되어 이웃과 함께 마음을 모아 풀어냈던 이 ‘씨ㅇㆍㄹ’들의 이야기 속에는 공통적으로 흐르는 뭔가가 있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함께 찾아낸 핵심 단어가 바로 ‘존중’과 ‘이야기’이다. 그래서 도봉이 꿈꾸는 문화도시의 이름을 ‘씨ㅇㆍㄹ의 이야기가 가득한 존중문화도시’라 부르며 ‘사람존중, 다양성존중, 연대존중, 문화존중, 지역존중’의 다섯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구체화하고 오늘의 언어와 문화로 담아내고자 하고 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의 생명 안에 담겨 있는 그 무한한 가능성을 믿고, 사람과 자연을 존중하며 함께 마을을 지키고 만들어 왔던 이 문화적 토양 위에서, ‘존중문화도시 도봉’의 새로운 이야기가 다시 시작되고 있다. 모든 생명이 그렇듯이, 다시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성장하여 열매 맺기 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동안 열심히 밭을 갈아엎고, 거름을 주고, 씨를 뿌려왔다. 아마도 더 넓게 기경하고, 더 많은 좋은 씨를 뿌려야 할 것이다. 그러나 씨를 뿌린 뒤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서둘러 가짜 열매를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물을 대며 기다리는 것이다. 때가 차면 그 안에 담겨진 생명이 자라나 문화로 꽃피우고 열매 맺을 것이다.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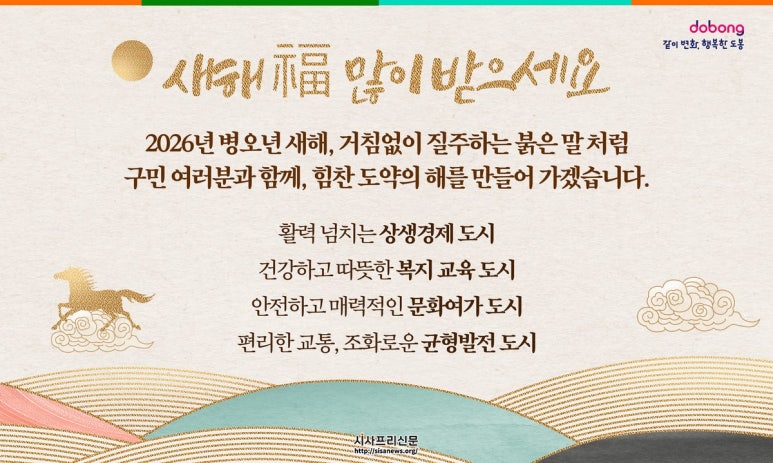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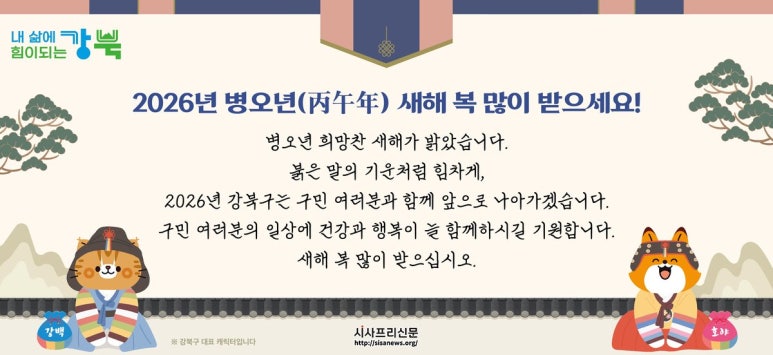






.jpg?type=w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