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3. 03. 02.
OECD 최하위권, ‘국민 행복 시대’는 요원한가
지난 2월 20일 통계청(통계개발원)에서 발간한 ‘「국민 삶의 질 2022」’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 중 5.9점에 불과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평균인 6.7점보다 0.8점이나 낮아 36위에 그쳤다. 일본 6.0점, 그리스 5.9점과 비슷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만족도가 한국보다 낮은 나라는 지속된 내전으로 사회적 갈등이 큰 콜롬비아(5.8점)와 이번에 지진이 발생한 튀르키예(4.7점)로 단 두 나라이기에 충격적일 뿐만 아니라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매우 강력한 국력을 보유하고 있고, 지난해 기준 국내총생산 1조 8,102억 달러로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를 자랑하고 잘 사는 강한 국가인 데 반하여 일반 국민은 중위권 국가의 국민보다도 약하고 불행하다는 것은 비극이 아닐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서글픔을 더하기 때문이다. ‘국민 삶의 질’ 지표는 인간의 복지(Well-being)와 후생, 사회적 발전을 제대로 반영한 국제적으로 GDP를 넘어선(Beyond) 지표인 ‘Beyond GDP’로 GDP 중심인 경제지표의 한계를 보완하고, 질적인 측면의 사회 발전을 측정하기 위해 연간 통계를 활용하여 우리 사회의 중·장기적인 삶의 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이번 보고서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삶의 질 변화를 진단할 수 있어 의미가 다르다.
통계청이 지난해 삶의 질과 관련한 71개 지표를 분석한 결과 18개 지표가 1년 전보다 악화됐다. 주로 여가·주거·가족·공동체 영역에서 삶의 질이 떨어졌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19가 팬데믹(Pandemic │ 세계적 대유행)이 끝나고 엔데믹(Endemic │ 풍토병)에 접어들면서 환경·고용·건강 등 항목은 다소 개선됐지만, 여가·주거·가족·공동체 영역에서 악화됐다. 또한, 1인당 국민총소득은 소폭 개선됐지만, 가계부채는 오히려 악화됐다.
2021년 1인당 국민총소득은 3,949만 원으로 1년 전보다 179만 원 증가했다. 하지만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총액의 비율인 가계부채비율은 2021년 206.5%로 1년 전보다 8.7%포인트 늘었다.
한국 가구의 가계부채비율은 2008년 138.5%에서 지난 13년간 꾸준히 높아져 왔다. 고물가로 인한 실질소득은 감소하고, 1,900조 원에 육박하는 과도한 가계부채와 금리 인상에 따른 가처분소득 축소로 소비까지 얼어붙고 있다. 일반 국민 상당수가 빚더미 위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방증(傍證)이다.
특히 감소추세에 있던 자살률이 2021년 인구 10만 명당 26명으로 전년 25.7명보다 늘었다. 70대(41.8명)부터 급격히 올라 80세 이상에선 61.3명으로 치솟았다. OECD 평균인 13.5%보다 3배가량 높은 노인 빈곤율(37.6%)과 심각한 사회적 고립도(60세 이상 41.6%)가 고령층의 사회안전망을 무너뜨리고 있다. 청년층도 위기다. 2021년 20대 사망 원인 중 56.8%, 30대 40.6%가 자살이다.
특히 20대 자살자는 2017년 16.5명에서 급격히 늘기 시작해 2021년 23.5명이 됐다. 4년 새 42.4%나 급증한 것은 청년들의 삶이 벼랑 끝에 내몰려 있다는 방증(傍證)이 아닐 수 없다.
지난 2월 1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1년 우울증 환자는 91만 785명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에는 79만 6,364명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연평균 5만여 명씩 증가한 셈이다. 이 같은 추세로라면 올해는 우울증 환자가 1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불안장애 환자도 5만 9,080명에서 11만 351명으로 늘었다. “폐쇄병동이 자해 청소년들로 가득하다.”라는 정신과 전문의들의 비명처럼 미래세대가 점점 불행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학의 경제학 교수 ‘리처드 이스털린(Richard Easterlin)’은 “소득이 어느 정도 높아지면 행복도가 높아지지만, 일정 시점을 지나면 행복도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라는 ‘이스털린의 역설(Easterlin Paradox │ 소득이 증가해도 행복이 정체되는 현상)’을 1974년에 쓴 ‘「경제성장이 인간의 운명을 개선시키는가?(Does Economic Growth Improve the Human Lot?)」’라는 그의 논문에서 제시한 바 있다.
또한 심리학자 ‘필립 브릭먼(Philip Brickman)’과 ‘도널드 캠벨(Donald Campbell)’은 1971년에 발표한 ‘「쾌락 상대주의와 좋은 사회 설계(Hedonic Relativism and Planning the Good Society)」’라는 논문에서 “생활 수준이 높아져도 행복한 감정은 오래가지 않기 때문에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쳇바퀴를 돌리듯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한다.”라는 이른바 ‘쾌락의 쳇바퀴(hedonic treadmill)’론을 발표했다.
1990년대 후반 영국 심리학자 ‘마이클 아이센크(Michael Eysenck)’는 이 개념을 ‘쾌락의 쳇바퀴 이론(hedonic treadmill theory)’으로 발전시켰고, ‘대니얼 카너먼(Daniel Kahneman)’은 1999년 한 걸음 더 나아가 ‘만족의 쳇바퀴(satisfaction treadmill)’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행복지수가 정체되는 시점은 보통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가 넘어선 때부터라고 한다. 영국 경제학자 ‘리처드 레이어드(Richard Layard)’는 「행복, 새로운 과학에서 얻는 교훈(Happiness: Lessons from a New Science)」에서 평균 연간 개인 수입이 2만 달러가 넘는 나라에서 그 이상의 수입은 행복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이른바 ‘레이어드 가설’을 제시했다.
그는 인간의 물질적 욕망엔 이른바 ‘만족점(Satiation point)’이 있다며 “생활 수준은 알코올이나 마약과 비슷한 면이 있다. 새로운 행복을 경험하게 되면,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이 가져야 한다. 일종의 쳇바퀴를 타는 셈이다. 행복을 유지하려면 ‘쾌락’이란 쳇바퀴를 계속 굴려야 한다.”라고 했다.
그래서인가? 한국의 1인당 GDP(국내총생산)는 1953년 67달러에서 2021년 3만 4,870달러로 무려 520배나 증가했지만, 유엔 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 발전해법 네트워크(SDSN)’에서 ‘2022년 세계행복보고서(WHR)’를 공개했는데 우리나라는 146개국 중 59위에 그쳤다. 2016년 58위, 2017년 56위, 2018년 57위, 2019년 54위, 2020년 62위를 기록하여 60위권 전후에 머물며 상위권으로 가지 못하고 있는데, 5년째 1위인 핀란드는 소득도 물론 높지만, 삶의 행복도 역시 높다.
불평등이 덜하고 약자들을 위한 안전망이 잘돼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부가 국민에게 높은 세율로 세금을 거두는 대신 수준 높은 교육과 의료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동체에 대한 높은 수준의 상호신뢰와 사회적 통합 높고 개인의 자율성도 존중된다는 의미다. 또한 국가의 지원을 통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환경조성과 더불어 저소득층에게 충분한 자금지원으로 빈부의 격차를 줄이는 등의 복지정책을 펼쳐 많은 핀란드 국민은 휴식 있는 삶을 즐기며, 자신의 행복에 집중할 수 있다고 한다.
반대로 한국은 남과 비교하며 끊임없이 경쟁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키운다. 초등학생 때부터 사교육에 내몰려 학습 경쟁에서 살아남도록 강요받고, 일상에선 SNS를 통해 끊임없이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이 많다. SNS에 올라온 타인의 일상과 나의 삶을 비교하며 우울감에 빠지는 것이다. 대표적인 소셜미디어인 카카오스토리·페이스북·인스타그램의 앞 글자를 따 만든 이른바 ‘카페인 우울증’에 빠진다는 것이다. 이제라도 외형적 성장에만 치우쳐 왔던 국가 목표의 과감한 수정을 검토하고 성찰해 봐야 할 때다.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라 일컫는 위상에 맞게 사회 구석구석을 돌아보고 일상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야 한다. 팽창지상주의에 내몰린 압축 성장과 돌격 성장 과정에서 놓쳤던 공동체의 복원, 여가의 확대, 일과 삶의 균형(워라밸 │ Work-life balance) 등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실천해 나가야 할 시점이다. 국가의 존재 이유는 오직 국민의 질 높은 삶이 아닌가 싶다. 사람이 최우선인 대한민국과 국민의 삶을 위해 존재하는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희망해 보면서 ‘국민 행복 시대’는 요원한가? 질문을 던져본다.
경제적 풍요만으로 선진국이 되는 것도 아니지만, 선진국의 위상에 걸맞도록 풍요 속에 뒤처진 사람들을 돌보고 함께하는 문화, 약자를 포용하고 배려하는 문화, 외면보다 내면을 중시하는 문화가 꽃을 피울 때 사회관계는 자연스럽게 회복되고 행복지수(HPI │ The Happiness Planet Index)도 가파르게 높아질 것이다.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이 되려면 경제지수(LEI)와 행복지수((HPI)의 격차를 좁혀나가야 한다. 결국, 소외된 한숨까지 국가의 복지가 충분히 감싸고 품고 보듬는 국가의 국민이 행복하지 않을 리 없다. 존중과 이해, 자아실현, 공동체 의식 확장 그리고 국가의 복지정책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고 융합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데 가일층 노력하고 정려해 나가야 할 것이다.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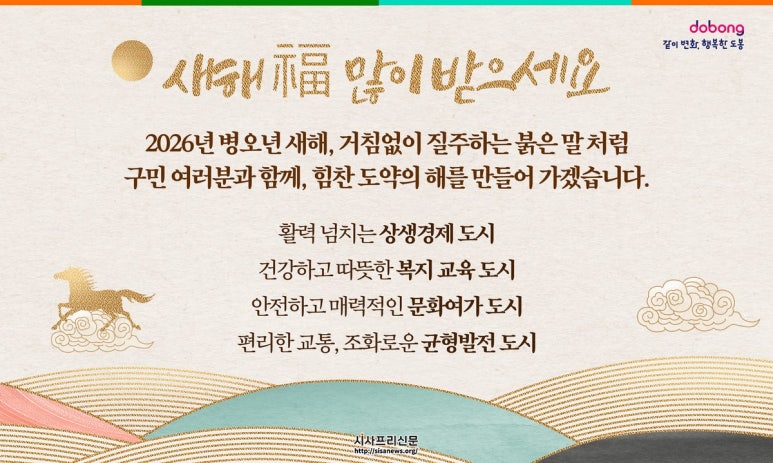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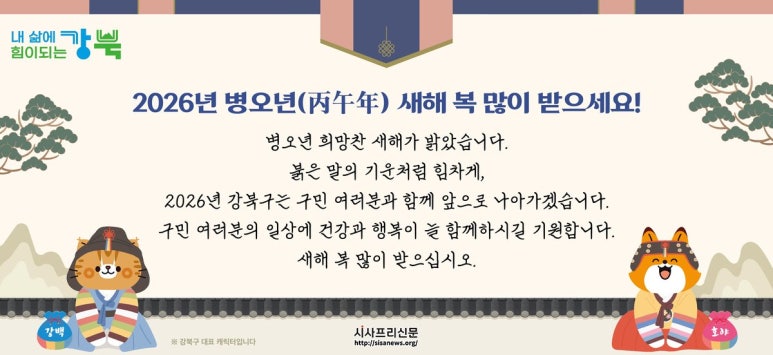






.jpg?type=w7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