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4. 03. 13.
다시 3%대 치솟은 엄중한 소비자 물가, 서민 안정에 총력 경주를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심상치 않다는 달갑지 않은 소식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다시 3%대로 치솟아 올랐기 때문이다. 물가를 끌어올린 주범은 신선식품이다.
32년 5개월 만에 최대치로 폭등한 과일은 이제 언감생심(焉敢生心) 사치품이 됐다. 물가는 민생의 시작이자 끝이다. 그만큼 서민의 삶을 좌지우지하고 들었다 놨다 민감하다는 의미다. 당연히 실질소득은 뒷걸음질 치고 일자리는 요원하며 물가는 천정부지(天井不知)로 뛰니 서민들은 어떻게 살아가라는 건지 한숨으로 물을 수밖에 없게 된다.
통계청이 지난 2월 6일 배포한 ‘2024년 2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3.77(2020=100)로 한 달 전보다 전월 대비 0.5%, 1년 전보다 3.1% 각각 상승했다. 지난해 8월부터 5개월 동안 3%대를 유지해오다 새해 첫 달 2.8%로 반짝 둔화했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불과 한 달 만에 3.1%로 다시 올라선 것이다.
올해부터 물가가 안정될 거라 한 정부 호언은 무색해졌다. 과일·채소 값 폭등이 계속된 데다 국제유가 불안까지 겹친 영향이 크다. 끈적하게 질척이며 이어지는 고물가가 서민 부담을 가중하고 민간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켜 경기 반등의 불씨마저 꺼뜨릴까 우려스럽기 그지없다.
지난해 10월부터 매달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던 신선식품 물가지수가 지난달에는 20.0%까지 뛰었다. 특히 신선과일은 지난달 41.2%나 올라 물가 상승을 주도했다.
1991년 9월에 기록한 43.9%에 이어 무려 32년 5개월 만에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이상기온으로 인해 수확량이 감소한 사과(전년 동월 대비 71.1%↑)를 시작으로 귤(78.1%↑), 토마토(56.3%↑) 등이 폭등했다. 대체재인 배(61.1%↑)와 딸기(23.3↑) 등 다른 과일 가격까지 끌어올리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과일 앞에 다 ‘금~’자를 붙여 ‘금 사과’, ‘금 배’라 불러도 무방해졌고, 채소 가격마저도 파(50.1↑)를 비롯해 12.3% 훌쩍 뛰었다.
국제유가가 들썩이면서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은 5주 연속 상승세다. 그 후과(後果)로 전체 458개 품목 중 구입 빈도가 높고 지출 비중이 높아 가격변동을 민감하게 느끼는 144개 품목으로 작성한 생활물가지수도 전 월 대비 0.6%, 1년 전보다 3.7% 뛰었다니 시민들이 지갑을 닫고 혀를 내두를 장바구니 물가를 실감케 된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2월 29일 발표한 ‘2024년 1월 사업체 노동력조사 및 2023년 10월 지역별 사업체 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노동자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은 355만 4,000원으로 전년의 359만 2,000원과 비교해 1.1% 감소했다. 실질임금은 근로자가 받는 명목임금에 소비자 물가를 고려해 산출한 값이다.
실질임금은 2022년에도 0.2% 줄었다. 2년 연속 감소한 것은 2012년 이후 처음이다. 2022년 물가가 5.1% 올랐을 때 실질임금이 0.2% 줄었는데, 물가가 3.6% 오른 지난해 실질임금이 1.1% 줄었다는 것은 생활이 더 팍팍해졌음을 의미한다.
식료품·비주류 음료의 가구당 실질 소비지출은 전년 대비 3.4% 감소했고, 그 감소 폭은 저소득층일수록 컸다. 물가는 오르고 쓸 돈은 줄자 결국 먹거리 소비부터 줄인 셈이다. 특히, 가처분소득 증가율을 물가상승률과 비교하면 더욱 심각하다. 지난해 가구의 가처분소득은 1.8% 늘어나는 데 그쳐 물가상승률 3.6%의 절반에 그쳤다. 특히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가 각각 6.8%와 6.0% 오른 것과 비교하면 지갑은 훨씬 얇아진 셈이다.
물가는 경세제민(經世濟民)의 핵심 요체다. 이렇게 물가가 불안해서는 한국은행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여지가 아예 없어진다. 금리가 내려가야 부채 부담이 줄어 소비가 늘고 내수가 살아나는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는데, 민생의 첫 출구부터 막힌 격이다.
물가는 계속 오르고 금리도 여전히 높고, 그 가운데 실질임금은 오히려 감소하고. 이렇다 보니 성장을 이끌어야 할 핵심축인 내수도 살아날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렇듯 여전한 물가 부담에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각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은 점점 뒤로 밀리고 있다.
아직 고물가·고금리·고유가 위기의 터널을 빠져나온 게 아니라는 뜻이다. 당분간 재정·통화정책은 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두고 운영되어야만 할 것이다. 앞으로의 상황도 그다지 녹록지는 않아 보인다. 그간 국내 물가를 자극했던 국제 곡물 가격은 급락하고 있지만 지난해 성행했던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 │ 가격을 그대로 둔 채 제품의 중량을 줄이는 꼼수)’같은 패키지 다운사이징(Package downsizing)’이나 ‘스킴플레이션(Skimpflation │ 가격과 중량을 그대로 둔 채 제품이나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꼼수)’ 등과 같은 시장 왜곡도 여전하다.
또한, 오름세를 보이는 국제유가도 변수다. 지난달 초 배럴당 75달러까지 떨어진 두바이유가 80달러를 훌쩍 넘었다. 과일 가격을 잡을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점도 물가 당국의 고민을 키운다. 정부가 3∼4월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600억 원을 투입하고, 수입 과일 3종(만다린·두리안·파인애플주스)에 대한 추가 관세 인하 적용 등 마트의 과일 직수입을 확대하기로 했지만, 그저 미봉책에 그칠 뿐이다.
물가가 하락하는 것과 단지 물가상승률만 둔화하는 것은 별건으로 구분해 봐야 한다. 물가 상승 부담은 쌓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1월 기준 최근 3년간의 물가상승률은 12%에 이른다. 그런 가운데 여전히 평년보다 가파르게 물가가 오르는 국면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최근 체감 물가 상승률은 훨씬 가파르다. 기름값, 전기요금, 교통비, 생필품 등 모든 것이 올라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물가의 상승압력은 더 세고 가파르다.
정부 설명대로, 두 개 전쟁 등 국제 여건 불안과 기후변화에 따른 작황 부진 등 불가항력적 요인이 물가를 끌어올린 부분도 없지는 않다. 하지만 달러당 1,300원 대의 환율 상승과 부동산 부양 정책 등이 구조적으로 물가 압력을 높인 것은 경제정책 운용에도 문제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잇단 부자 감세로 정부 재정이 쪼그라들면서 고물가 부작용에 대응할 여력마저도 뚝 떨어져 있는 것 아닌지도 의문이 많다. 먹고, 입고, 잠자는 서민들의 생활 곳곳에서 한숨 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작금의 먹거리 물가를 허투루 봐선 안 된다. ‘블랙스완(Black Swan │ 예측 자체가 어려워 대응 곤란)의 예고편일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안정적인 물가야말로 최고의 민생 정책이 아닐 수 없다. 장바구니 물가 폭등에 죽어나는 건 서민이기 때문이다. 통계상으로 보면 소득 하위 20%의 경우 식비가 가처분소득의 절반에 육박한다. 지난달 체감 물가를 보여주는 생활물가지수는 116.29(2020=100)로 3.7% 상승해 소비자물가지수 113.77(2020=100)인 3.1%보다 오름폭이 크다.
물가는 민심과 직결된다는 점을 정부와 정치권은 각별 유념하고 품목별 물가 관리와 더불어 시장 왜곡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불요불급(不要不急)한 요금 인상을 줄이는 등 가용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물가 안정에 국가 역량을 총력 집주(集注)해야만 한다.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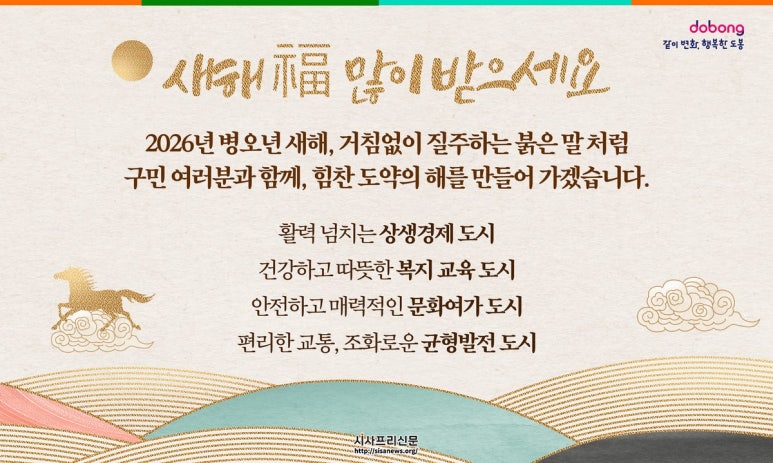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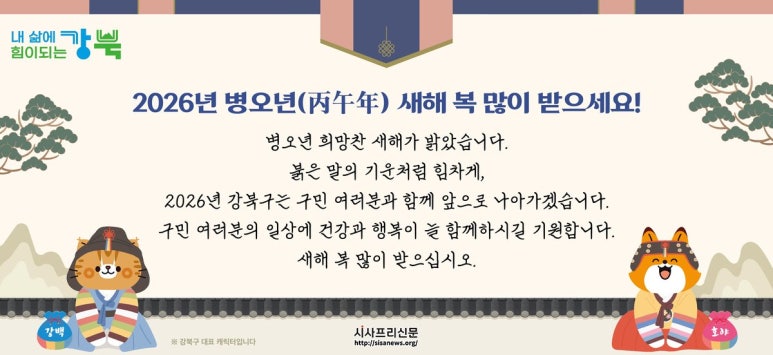






.jpg?type=w7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