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5. 01. 15.
들썩이는 물가상승·가라앉은 소비심리, 명절이 두려운 서민경제
새해 벽두부터 들썩이고 있는 물가 오름세가 심상치 않다. 환율급등 여파로 먹거리와 생활필수품 가격이 줄줄이 급등하고 농수산물값도 치솟으며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 움직임마저 줄을 잇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해 12월 31일 발표한 ‘12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4.91(2020년=100)로 전년 동월 대비 1.9% 상승했다. 최근 물가 상승률은 2024년 9월 1.6%, 10월 1.3%, 11월 1.5%, 12월 1.9%까지 4개월간 1%대 기록을 이어오고 있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대로 반등할 것이라는 우려 섞인 관측까지 나온다.
경기 침체 속에 물가가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대재앙이 현실로 닥치는 게 아닌지 걱정스럽기까지 하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정국 여파로 ‘1%대 성장’ 쇼크가 몰아치고 물가마저 들썩여 서민들의 생활고가 가중되고 있지만, 정부는 마땅한 민생 해법과 출구전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계속되는 정국 불안에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또 낮췄다. 정부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1.8% 전망치는 잠재성장률 2%를 밑돌 뿐 아니라 지난해 하반기 정부 전망치보다는 0.5%포인트나 하향했다. 한국은행 전망치 1.9%보다 0.1%포인트 낮은 것이다.
시장 상황에 민감한 IB들도 ‘성장률 쇼크’를 경고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JP모건과 HSBC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한 달 새 각각 1.7%에서 1.3%로, 1.9%에서 1.7%로 낮추면서 소비자물가지수 예상치는 각각 1.7%에서 2%로, 1.9%에서 2%로 오히려 높였다.
실제로 민족 대명절 설을 3주 앞두고 겨울 배추 무 가격이 1년 전보다 60~70% 가까이 올랐다. 지난 1월 5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배추 평균 소매가격은 지난 3일 기준 한 포기에 5027원으로 1년 전보다 58.9%, 평년에 비교해 33.9% 올랐다.
평년 가격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가격 중 최대·최소를 제외한 3년 평균이다. 무는 한 개에 3,206원으로 1년 전보다 77.4%, 평년보다는 52.7% 올랐다. 차례상에 올리는 배(신고) 평균 소매가격은 10개에 4만 1,955원으로 1년 전보다 24.6%, 평년보다 23.5% 올랐다.
사과(후지) 평균 소매가격은 10개에 2만 6,257원으로 1년 전보다 10.2% 내렸지만, 평년과 비교하면 3.1% 올랐다. 감귤은 10개에 4,804원으로 1년 전보다 12.3% 상승했고 평년과 비교해서는 63.3% 올랐다. 딸기는 100g에 2,542원으로 1년 전, 평년보다 각각 10.4%, 25.4% 비싸졌다.
배추와 무 가격이 오른 것은 지난해 여름철 폭염에 추석 이후까지 늦더위가 이어지면서 생육이 부진한 탓이 크다. 지난해 김장철 가격 안정을 위해 배추와 무 조기 출하가 이뤄진 데도 영향을 미쳤다.
또한, 원·달러 환율 상승(원화 가치가 하락)세가 지속하는 가운데 국제유가까지 오르면서 국내 주유소의 휘발유·경유 판매가격이 1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기름값 상승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월 5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월 첫째 주(12월 29일 ~ 1월 2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직전 주 대비 리터(ℓ)당 8.8원 상승한 1,671.0원을 기록했다.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리터(ℓ)당 9.1원 상승한 1,516.3원이었다. 지난해 9월부터 1,400원대를 유지하던 경유는 12월 넷째 주(1,507.2원)부터 1,500원대로 올라섰다.
문제는 고환율이 지속하면서 식품 가격이 더 오를 것이란 점이다. 지난달까지 4개월간 1%대를 유지한 물가 상승률이 이달에는 2%대로 올라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국소비자원이 전국 대형마트와 편의점 500여 곳을 조사해 발표하는 ‘생필품 가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기준 초콜릿, 카레, 커피 등 주요 가공식품 175개 품목 가운데 121개 품목의 평균 가격이 1년 전보다 상승했다.
175개 생필품의 평균 물가상승 폭은 3.9%로 지난해 연간 소비자물가상승 폭 2.3%보다 높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새해 들어 식품 약품 화장품 가격이 줄줄이 인상되고 있다. 전체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 3개월 연속 1%대 상승을 유지하며 안정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생필품 가격은 빠르게 상승하는 모습이다.
반면 저소득 서민층인 소득 1, 2, 3분위의 연도별 경상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 등 모든 소득 포함) 증가율은 최근 3년간 축소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이는 서민층의 부채 증가로 이어지고 있으며, 2021년 하반기 이후 금리 상승이 겹치면서 서민의 살림살이가 점점 더 팍팍해지는 상황이다. 최근 내수한파의 조짐이 더 뚜렷해지면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재무난은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빚 독촉을 견디다 못해 새출발기금을 찾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새출발기금을 통해 매입할 부실채권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 캠코의 부채 증가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새출발기금을 통해 매입하기로 한 자영업자 부실채권 규모는 총 33조 4,000억 원에 이른다. 이 중 올해 말 기준 누적 인수 예상 규모는 약 17조 3,000억 원 정도로 목표 대비 절반 정도다.
올해가 지난 후에도 캠코가 인수해야 할 부실채권이 10조 원 넘게 남게 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최근 생필품 가격까지 치솟자 “내 월급만 빼고, 다 오른다”라는 비명과 한숨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실정이다. 경기 침체 속에서 생활물가 고공행진으로 서민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조만간 물가 관리 대책을 발표하고, 설 성수기 관련 성수품 공급 확대와 할인 행사를 역대 최대수준으로 지원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서민의 설맞이가 조금은 수월해질 수는 있겠지만, 그마저도 미봉책일 뿐이라고 전망한다. 소비심리는 급격히 얼어붙었고, 경제성장률·일자리 전망치는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 전반에서 심화하고 있는 초(超)양극화를 완화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중장기적 정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무엇보다 정치 불안을 조기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재정을 동원해 하루빨리 급한 불부터 서둘러 끄고,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정국이 야기한 불확실성이 키운 정치적·경제적 리스크를 조속히 제거해야만 한다.
일회성 보여주기식 대책에 그쳐서는 결단코 안 된다. 긴 안목에서 민생안정을 기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이 절실하다. 정부는 거시경제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만 할 것이다.
발등의 불인 환율을 방어하는 데 가용 가능한 정책역량을 총동원해 집중적으로 관리해야만 한다. 재정 신속 집행과 금리 인하도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불가피하지만, 물가를 자극하지 않도록 정교한 대응도 시급하다.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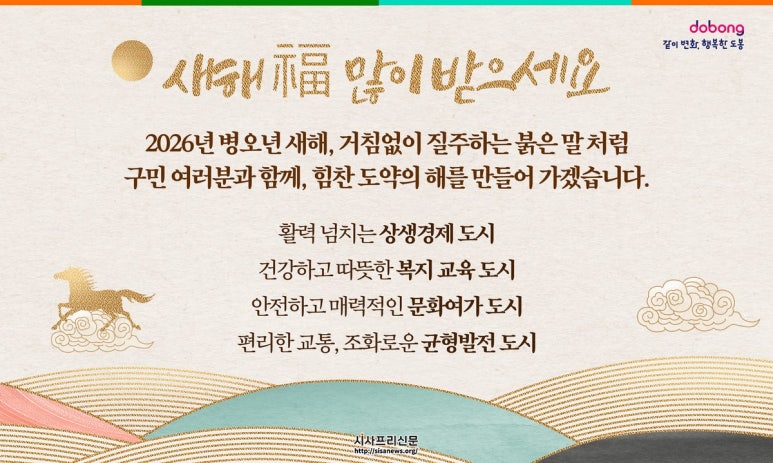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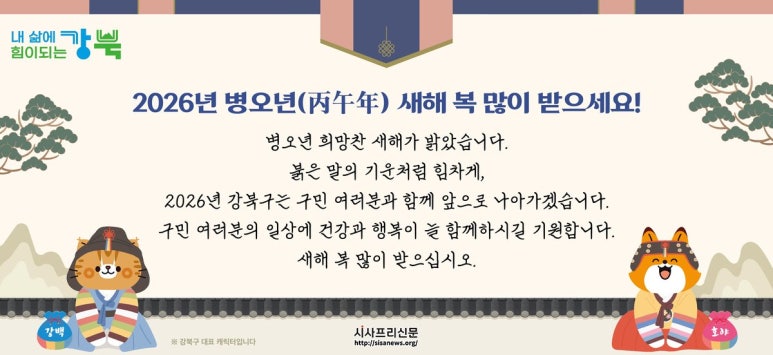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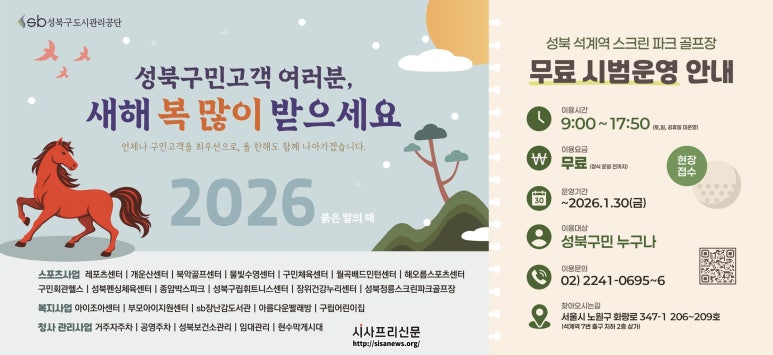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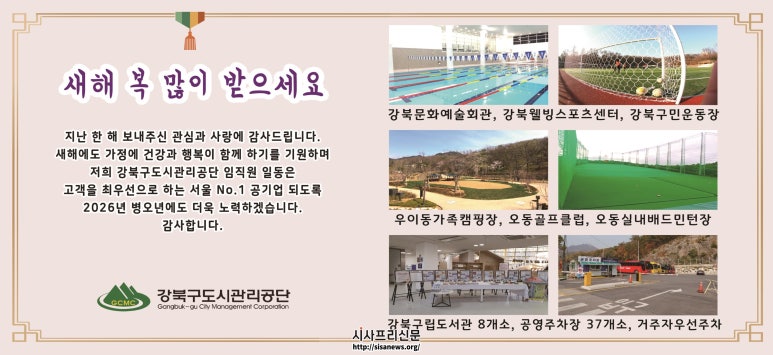
.jpg?type=w7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