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5. 03. 05.
환율 급등 고착화에 물가 앙등 장기화, 가계 부담 덜어주는 게 국가 책무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의 폭발적 공포로 인해 원·달러 환율이 치솟으며 금융시장이 크게 출렁이고 이러한 고환율에 따른 원가 부담을 이유로 잇따라 제품 가격이 오르고 있어 고물가의 파고는 저소득층의 고충을 더 크게 덮쳐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전방위적 관세 압박과 ‘엔비디아(NVIDIA)’ 등 미국 기술주 급락 충격으로 지난 2월 28일 국내 금융시장은 충격적인 폭락으로 이어졌다.
이렇듯 미국 도널드 트럼프발(發) ‘글로벌 관세전쟁’ 시계가 급격히 빨라지면서 지난 2월 28일 코스피(KOSPI)지수는 3.39% 급락한 2532.78에 거래를 마쳐, 지난해 8월 ‘블랙 먼데이(Black Friday │ 경제 위기의 날)’ 이후 가장 큰 하락률을 기록했다.
코스닥(KOSDAQ)지수도 3.49% 밀린 743.96에 마감했다. 일본 닛케이225지수와 홍콩 항셍지수는 각각 2.88%, 3.28% 떨어졌다.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1.98% 하락했다.
휘몰아치는 관세 폭풍에 글로벌 경기가 둔화할 것이란 우려에 ‘패닉셀(Panic-sell │ 공포 매도)’ 물량이 쏟아진 것이다. 지난 2월 28일 원·달러 환율도 전 거래일보다 20.4원이나 급등한 1463.4원에 주간 거래를 마감했다.
금융시장의 ‘검은 금요일(Black Friday)’은 트럼프 정부의 ‘관세 변덕’ 탓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에 멕시코·캐나다 관세 부과에서 유예했다가 이를 뒤집고 3월 4일부터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다. 중국에는 기존 10% 관세 부과에 이어 10%를 추가 부과하겠다고 했다.
그동안 관세가 협상수단에 불과하다는 낙관론이 우세했지만 급변한 관세 예고에 시장은 불확실성 회피 심리로 출렁인 것이다. 미국발(發) 혼란에 특히 크게 휘청이는 건 원화 가치 하락이다. 관세안에 시장의 공포심리가 커지자 안전자산 선호에 따라 원·달러 환율이 다시 급등했다.
원화 자체의 절하 압력도 겹치면서 강(强)달러 압력에 더 크게 휘둘리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치 불확실성으로 내수경제가 내상을 입었고, 수출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로 트럼프 정책 불확실성을 반영해 경제성장률 전망이 하향조정되면서 원화 가치 하락 움직임이 불가피한 상황에 봉착한 결과다.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지난달 일본 엔화(+3.03%), 중국 역외 위안(+0.39%), 대만 달러(+0.15%) 등은 전월 대비 달러보다 가치가 상승했지만, 원화 가치만 오히려 0.45% 떨어졌다. 주변국 통화 대비 원화의 가치가 추락했다는 의미다.
고환율은 가뜩이나 어려운 민생 경제를 더욱 도탄에 빠뜨릴 수 있다. 지난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12·3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가 겹치면서 환율이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가 관세전쟁을 확대하면 할수록 환율은 더 치솟고 수입 물가도 상승할 것은 자명해 보인다. 이미 기업들은 수입 원가 상승을 이유로 가격 인상이 줄을 잇고 있다.
지난 3월 2일 식품·외식업계에 따르면 CJ푸드빌이 운영하는 뚜레쥬르는 이달부터 빵과 케이크 110여 종의 가격을 5%가량 올렸다. 이에 따라 ‘데일리 우유 식빵’은 3600원, ‘단팥 빵’은 1,900원으로 100원씩 인상됐다. 부드러운 ‘고구마 라떼 케이크’는 3만 원에서 3만 1,000원으로 1,000원 올랐다.
지난달에는 SPC그룹의 파리바게뜨와 던킨이 제품 가격을 약 6%씩 인상했고, 삼립도 ‘포켓몬 빵’과 ‘보름달’ 등 주요 제품 가격을 100원씩 올렸다. 커피 가격도 줄줄이 오르고 있다. SPC그룹의 던킨이 ‘아메리카노’를 3,700원에서 3,900원으로 200원 인상한 데 이어 배스킨라빈스도 3월 4일부터 아메리카노 가격을 400원 올린다. 스타벅스코리아와 할리스, 폴바셋은 지난 1월 이미 가격을 인상했으며 파스쿠찌와 컴포즈커피는 지난달 가격을 올렸던 바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5.71(2020=100)로 전년 동월 대비 2.2% 상승했다. 통계청은 이 같은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고환율과 국제유가 상승으로 지목했다. 한국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로, 고환율이 지속하면 수입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이 상승해 전반적인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한다.
실제로 올해 1월에는 석유류 가격이 전년 동월 대비 7.3% 상승해 물가 상승의 가장 큰 요인이 됐다. 석유 제품은 고환율에 빠르게 반응하는 반면, 가공식품·외식·기타 원자재는 일정 시차를 두고 영향을 받기 때문에 1월의 물가 상승세가 2월에도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
2024년 연간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산업생산은 전년 대비 1.7% 증가했으나 소비는 21년 만에 최대 폭(-2.2%)으로 감소했다. 소비 감소는 승용차 등 내구재(-3.1%),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1.4%), 의복 등 준내구재(-3.7%) 전반에서 나타났으며, 소비 위축은 2022년부터 3년 연속 지속하고 있다. 이렇듯 가격 인상이 소비자의 지갑을 닫게 해 내수를 더욱 옥죌 수밖에 없는데도 정부의 대책은 눈에 띌 만큼 보이지 않고 있다.
내수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유일한 경제 버팀목이던 수출마저 흔들리고 있어 심각성을 더한다. 지난달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16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하면서 올해 수출 부진 경고등이 켜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폭탄까지 본격화되면 수출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비등한다.
지난 3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2월 반도체 수출은 96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3%나 줄었다. 2023년 11월 반도체 수출이 플러스(+) 전환한 후 15개월 연속 증가했던 흐름이 끊긴 것이다. 지난해 2월 66.7%였던 반도체 수출 증가율은 올 1월 8.1%로 급락했다.
중국산 저가 공세로 낸드플래시 등 범용 메모리 반도체 고정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지며 지난달 반도체 수출이 하락세로 전환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1∼2월 누적 수출액은 1,017억 달러로 전 년 동기 대비 4.75% 줄어들었다. 설 연휴 영향을 배제하더라도 올해 수출액이 감소한 것으로 수출 둔화세가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한국은행과 해외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속속 하향 조정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리더십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경제 심리도 갈수록 약화하고 있다는 방증(傍證)이다.
이렇듯 다시 물가가 고공행진을 지속하면서 서민들의 한숨 소리만 깊어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악화일로(惡化一路)로 치닫는 것은 고환율·고유가 상황이 계속되고 본격화된 미국의 관세 정책 등 악화한 대외 여건이 근인(根因)이다. 물가가 오르면 소비자의 지갑이 얇아지고 일상의 부담과 어려움은 가중될 수밖에 없고 소비 심리 위축은 경기 둔화로 이어질 수 있어 경제에도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게다가 고물가는 경기 부양을 위한 금리 인하 등 통화 정책 전환에도 걸림돌이어서 내수 부진의 골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도 내수 부진에서 비롯된 경기침체에 더해 환율 급등에 따른 인플레이션까지 덮치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국면으로 빠져드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은 경기 침체(Stagnation)와 물가 상승(Inflation)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제 현상을 일컫는다.
밥상 물가가 들썩이니 민생이 편할 리는 만무(萬無)하다. 민생 회복을 위해선 보다 치밀하고 정교한 물가 관리에 집중해야만 한다. 더욱이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게 국가의 책무임을 각별 명심해야만 한다.
작금의 한국 경제는 안팎으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그야말로 내우외환(內憂外患)의 풍전등화(風前燈火)에 누란지위(累卵之危)의 위기(危機)에 봉착한 백척간두(百尺竿頭)의 나락(奈落)에 서 있는 한국 경제가 처한 상황을 고려할 때 한 방에 해결할 비급(祕笈)이나 특효약은 없어 보인다.
우선은 재정 역할을 늘리고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급선무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히 마련해 경기 회복의 마중물로 삼는 것만이 첩경(捷徑)이다. 특히 서민들을 구제하기 위한 특단 대책이 무엇보다 화급(火急)하다.
가계 지출 가운데 생필품 비중이 작아져야 내수 경기도 살아난다는 단순 논리를 각별 유념해야만 한다. 기업도 원가 절감 등의 노력으로 제품 가격 인상을 최대한 늦추는 ‘내핍(耐乏)’과‘고통 분담’은 필수불가결(必須不可缺)의 추상(秋霜)같이 준엄(峻嚴)한 명제(命題)다.
이 모든 사안을 여야와 정부가 긴밀히 머리를 맞대고 서둘러 지혜를 모아 풀어야만 한다. 당리당략(黨利黨略)에만 매몰되어 여(與)·야(野)·정(政) 국정협의회가 공전만 거듭하는 사이 ‘골든타임(Golden-time)’만 속절없이 흘러갈 뿐이다.
그런 점에서 조속히 운영을 정상화하여 추락하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고 출구가 안 보이는 길고 긴 저성장의 터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핵심 쟁점들의 합의를 서둘러 도출(導出)하고 도탄(塗炭)에 빠진 민생을 최우선으로 물가 앙등을 잡고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데 총력 경주해야만 할 것이다.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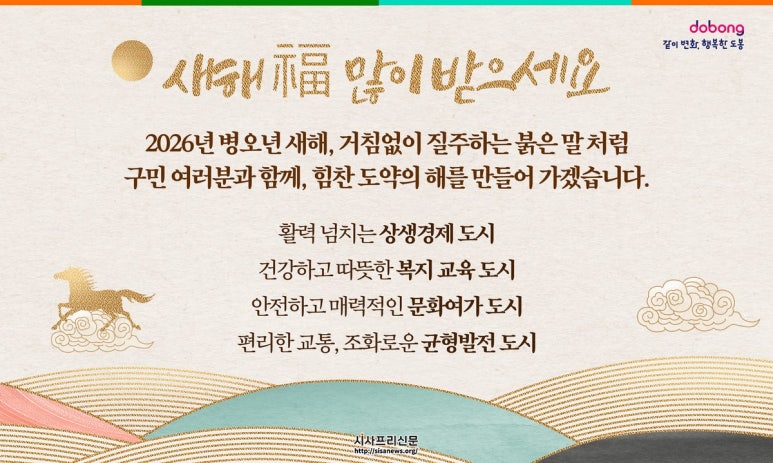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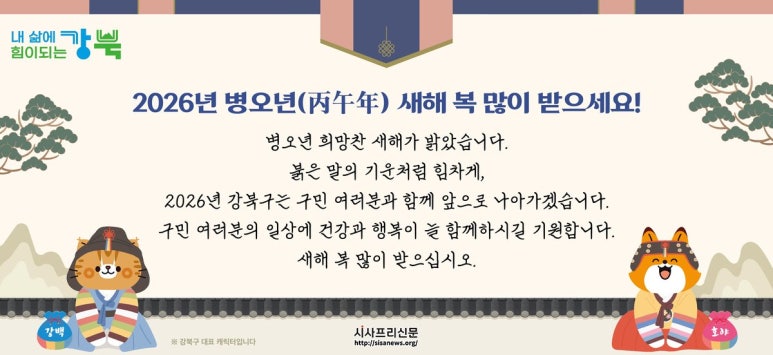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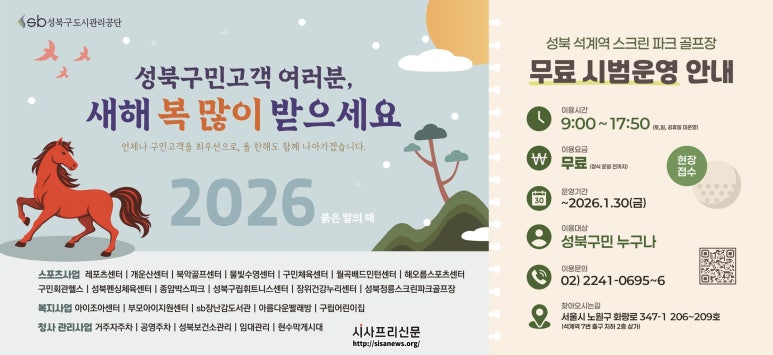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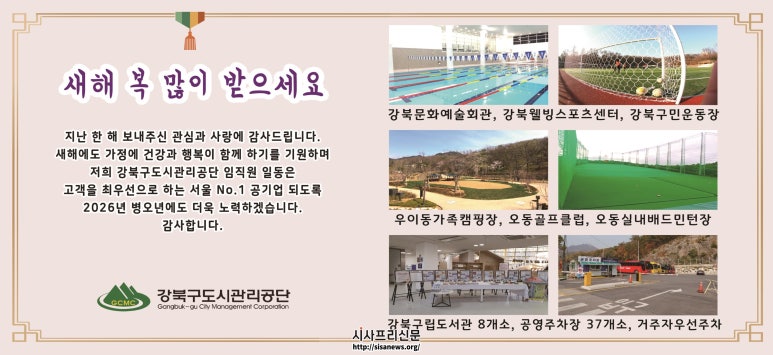
.jpg?type=w7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