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5. 03. 19.
자영업 줄폐업에 가계부채 세계 2위
오르는 건 강남 집값과 대기업 봉급뿐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 발(發)‘관세 폭탄’이 ‘R(Recession │ 경기 침체)’의 공포로 파란을 일으키며 미국의 경기 침체를 포함한 ‘트럼프 스톰(Trump Storm)’으로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경제는 내수 위축으로 빈사(瀕死) 상태에 이르고 1%대 성장률 쇼크는 이미 기정사실이 됐다.
지난 1월 제조업 생산지수(원지수 │ 2020년=100)는 103.7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2% 감소했고,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실물경제의 3대 축인 생산(전산업 0.3%↓)·소비(소매판매 0.4%↓)·투자(설비투자 5.8%↓)가 동시에 ‘트리플(Triple) 감소’하는 삼중고(三重苦)를 겪으며 내수 침체가 고착화(固着化)하면서 한국 경제가 정점을 찍고 내리막길에 들어섰다는 ‘피크 코리아(Peak Korea)’ 징후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그야말로 풍전등화(風前燈火)로 백척간두(百尺竿頭)의 나락(奈落)에서 사면초가(四面楚歌)에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 │ 총체적 복합위기)’이라는 누란지위(累卵之危)의 경제 위기(危機)에 봉착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3월 14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3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고용 애로가 지속하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3개월째 “경기 하방압력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직업도 없고, 진학 준비나 적극적인 구직 활동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쉬었음’ 청년 인구가 처음으로 50만 명을 넘어서면서 청년층의 경제활동 포기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충격을 주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 3월 12일 발표한 ‘2025년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29세 청년층의 ‘쉬었음’ 인구가 50만 4,000명으로 전년 같은 달 44만 3,000명 대비 6만 1,000명(13.8%↑)이나 늘었다.
청년층 쉬었음 인구가 50만 명을 넘어선 것은 2003년 통계 작성 이래 최초다. ‘쉬었음’은 일을 하거나 구직 활동을 하지 않은 채 그냥 쉬고 있는 상태로 중소기업들은 인력난을 겪고 있는데 청년들은 취업할 수 있다는 희망의 끈을 놓고 있다는 의미다.
한국 경제의 위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다. 지난해 전체 취업자에서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19.8%를 기록했다. 연간 기준으로 자영업자 비율이 20% 아래로 떨어진 것은 통계 집계 이후 처음이다. 올해 1월의 자영업자 비율도 19.7%로 1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저치다. 내수 침체 장기화와 원재료가격 급등으로 자영업자 수가 최근 두 달간 20만 명 넘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3월 10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월 국내 자영업자 수는 코로나 사태 당시 수준인 550만 명으로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보다 적다.
이는 작년 11월 570만여 명보다 20만 명가량 감소한 수치로 연도별로 보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590만 명), 1998년(561만 명),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600만 명, 2009년 574만 명보다 적은 수준이다.
문제는 자영업자 수가 너무 많은 데다 비중이 지나치게 커 한국 경제의 약한 고리로 전락한 것이다. 자영업자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8위 수준이다. 주요국이 10%를 넘지 않는 것과 큰 대비를 이룬다.
한국경제인협회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7일까지 국내 자영업자 500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자영업자들은 원자재·재료비(22.2%), 인건비(21.2%), 임차료(18.7%), 대출 상환 원리금(14.2%) 순으로 부담이 크다고 응답했다. 현재 영업 중인 자영업자 10명 중 4명이 3년 내 폐업을 고려하고 있으며 작년 순이익은 전년 대비 13.3%나 감소했다고 답했다.
지난해 매출이 감소했다고 72.0% 응답했고, 증가했다는 응답은 28.0%였다. 올해도 순이익과 매출이 줄어들 것이라는 응답 비율은 각각 62.2%, 61.2%로 나타났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경쟁력도 떨어져 2023년 월수입 1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922만 185명으로 개인사업자가 전체의 75.7%나 된다.
구체적으로는 연간 0원 소득을 신고한 개인사업자가 105만 5,024명, 0원 초과 1,200만 원 미만 소득을 신고한 개인사업자가 816만 5,161명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자영업자 감소는 내수 부진 등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어설픈 사회 안전망으로 ‘생계형 창업’에 나서며 준비 없이 뛰어든 탓이 크다. 경쟁에서 밀리고 빚으로 버티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한국은행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2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잔액은 1,070조 1,000억 원으로 이 중 3곳 이상의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 대출잔액은 753조 8,000억 원으로 다중채무의 비중이 무려 70.44%에 달한다. 경기 침체가 자영업자에게 직격탄이 되고 있고 구조적으로도 창업 과잉이 이어지고 있다 보니 자영업자 폐업이 늘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 때문에 자영업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자영업자 비율 하락은 나쁘지 않다고 여길 수도 있고, 경제 성장과 산업구조 전환 등으로 인해 자영업 비중이 줄어들 수도 있다.
하지만 작금의 자영업자 감소세는 여간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다.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의 영향이 짙게 드리운 탓이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인협회의 설문 조사 결과에 의하면 올해도 순이익과 매출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 응답자가 각각 62.2%, 61.2%에 이른다.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지를 극명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자영업자들은 한국 경제의 중요한 축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구조적 문제를 방치(放置)하고 방기(放棄)한다면, 향후 자영업자 수는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다. 폐업 후 실업급여를 받은 자영업자도 지난해 4년 만에 2.3배나 늘었다. 뛰는 물가와 높은 금리 부담에 소비 심리 위축까지 더해지며 자영업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는 곧 대량 실업과 경제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이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창업 장려 정책을 뛰어넘어 자영업자가 폐업 후에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연계 정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창업 희망자에게는 실질적인 멘토링·금융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실패 시 재기할 안전망이 만들어져야 한다.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상용 근로자의 연간 임금 평균은 1년 전보다 2.9% 오른 4,917만 원이었다.
하지만 임금 상승 혜택이 고루 돌아간 건 결코 아니었다. 300인 이상 대기업 연봉은 2020년 5,995만 원에서 4년 만에 2024년 7,121만 원으로, 1,126만 원(18.8%) 올랐다. 같은 기간 300인 미만 중소기업 연봉은 3,847만 원에서 4,427만 원으로, 4년간 580만 원(15.1%) 올랐다. 대기업 연봉이 중소기업 연봉보다 546만 원(3.7%포인트) 더 오른 셈이다. 임금 상승률도, 상승액도 대기업이 더 가팔랐다.
그 결과 중소기업 상용직 임금 수준이 2020년 대기업의 64.2%에서 2024년 62.2%로, 격차가 더 벌어졌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 근로소득자 2,085만 명 가운데 71%가 연봉 5,000만 원 이하다.
하지만 연공형 임금 체계와 대기업 중심 노조 때문에 대기업 임금만 쑥쑥 올라 이제 직장인 15명 중 1명꼴로 억대 연봉자다. 한국 대기업 임금이 일본 대기업의 1.5배 수준에 달하는 지경이다. 소득 격차뿐 아니라 자산 양극화 심화도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한, 새해 들어 서울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올해 들어 강남 집값이 다시 꿈틀거리고 있어서다.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3월 6일 발표한 ‘3월 첫째 주(3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0.14% 오르며 전주(0.11%)보다 상승 폭이 확대됐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도 1주 전보다 0.16% 올랐다. 특히 송파구가 0.68%나 급등하며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것이다. 강남·서초구도 각각 0.46% 오르며 상승을 이끌고 있다.
집값 급등기인 지난 2018년 2월 첫째 주(0.76%) 이후 7년 1개월 만의 최대 상승 폭이다. 더 나아가 마포·광진(0.09%→0.11%), 용산(0.08%→0.10%), 강동(0.09%→0.10%) 등 주변 지역으로 상승세가 확산했다. 특히 송파구 집값은 7년 만에 최대폭 상승이다.
이 여파는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주변 지역으로 상승세가 확산하고 있다. 반면 노원, 도봉, 강북 등은 하락했다. 지난 정부 시절에 ‘미친 집값’으로까지 불리던 집값 상승세는 멈추고 지난해 전국 집값이 0.2% 하락했다. KB 부동산 보고서에 따르면 부동산 전문가의 62%, 공인중개사의 79%, 자산 관리 전문가의 62%가 올해도 전국 집값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가 나쁘고 인구가 감소하는 등 집값 상승 요인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서울의 일부 지역은 예외가 아닐 수 없다. 지난해 2분기 이후 대구(-2.7%), 부산(-2.0%), 광주(-1.2%) 등 전국 각지 집값이 하락하는 동안에도 서울(2.0%), 경기(0.3%)만 상승했다. ‘똘똘한 한 채’로 몰리는 현상이 심해지면서 처음으로 ‘평당 2억 원’을 넘는 아파트가 등장했다.
지난 2월 12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송파구 잠실동 등 국제교류복합지구(GBC │ Global Business Complex) 인근 아파트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이후 강남 3구를 중심으로 거래가 늘고 매매가 상승 폭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 부동산 정책 컨트롤타워 부재 등이 서로 맞물리면서 ‘영끌’이 이끄는 집값 폭등장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심히 커지고 있다. 전용 84㎡ 아파트 가격이 해제 전 27억 2,000만 원에서 해제 후 28억 2,000만 원으로, 한 달 새 1억 원(3.7%) 올랐다. 내수 침체가 길어지고 1%대 저성장이 예고될 정도로 나라 경제는 가라앉고 있다.
그런 와중에서 일부의 소득·자산이 비정상적으로 오르는 현상은 경제 고비용 구조를 만들고, 사회 갈등도 증폭시킨다. 심각하게 바라보고 가능한 한 정책 대응 수단도 서둘러 강구해 선제 대응해야만 한다. 대출 금리도 내리고 있어 ‘영끌’에 다시 불을 붙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비등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소용돌이 와중에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경제 규모를 감안할 때 세계 2위라는 국제기관의 조사 결과가 나와 충격파가 크다. 국제금융협회(IFF)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한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1.7%로 38개국 중 캐나다(100.6%)에 이어 2위를 기록해서다.
세계 평균(60.3%)을 훌쩍 웃도는 수치다. 집값 상승이 대출 증가로 이어지고, 대출 증가가 다시 집값을 끌어올리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는 경우 가계부채는 한국 경제의 안정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지난해 4분기 국내 가계 신용이 전분기보다 증가 폭이 줄어들면서 가계부채는 역대 최대 규모인 1,927조 3,000억 원으로 불어났다. 전분기 말 대비 13조 원 증가했다.
가계 신용의 구성 항목별로는 가계대출 잔액이 지난해 4분기 말 기준 1,807조 원으로 전 분기 대비 10조 6,000억 원 늘었다. 이중 주택담보대출이 1,123조 9,000억 원으로 11조 7,000억 원 증가했다. 한동안 주춤하던 금융권 전체의 가계대출이 지난달 4조 원 넘게 불어나 가계부채 2,000조 원 시대를 맞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마당에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아파트값 상승률은 2018년 이후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집값 약세 지역인 ‘노·도·강(노원·도봉·강북)’과 ‘금·관·구(금천·관악·구로)’ 지역 집값까지 오르기 시작했고,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6개월 만에 최대치를 찍었다.
올해 매매된 서울 아파트 중 절반 가까이는 전고점 대비 90% 이상 가격에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구와 서초구는 전체 (매매) 거래 중 30% 이상이 신고가를 기록했다. 지난 3월 10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의 아파트 매매가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2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5,983건 중 2,759건(46%)은 종전 최고가(2006년~2024년 기준)와 비교해 90% 이상의 가격 수준에서 거래된 것으로 집계됐다.
집값이 오르면 무주택자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해 가계부채는 더욱 증가하고 내수 회복도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이미 내수 부진이 장기화를 넘어 고착화하면서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 모두 소매 판매가 감소(2.2%↓)했다.
수출이 감소(2.7%↓)하고 내수도 여의치 않으면 경기 침체의 우려도 커진다. 설익은 정책으로 집값만 자극하고 가계부채까지 불리는 치둔(癡鈍)의 우(愚)만은 제발 없어야 한다. 자영업 줄폐업에 가계부채 세계 2위, 오르는 건 강남 집값과 대기업 봉급뿐이라니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아파트값·가계대출·환율이 더 불안해질 수 있는 만큼 신속한 특단 대책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지난 3월 15일 미국이 원자력과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분야 협력을 제한할 수 있는 ‘민감국가(Sensitive Country) 리스트’에 한국을 포함한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이럴 때일수록 여(與)·야(野)·정(政)은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국가적 위기를 극복할 힘과 지혜를 모아 높고 튼튼한 방파제를 쌓아 확고한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국가 역량을 총 집주(集注)해야만 한다.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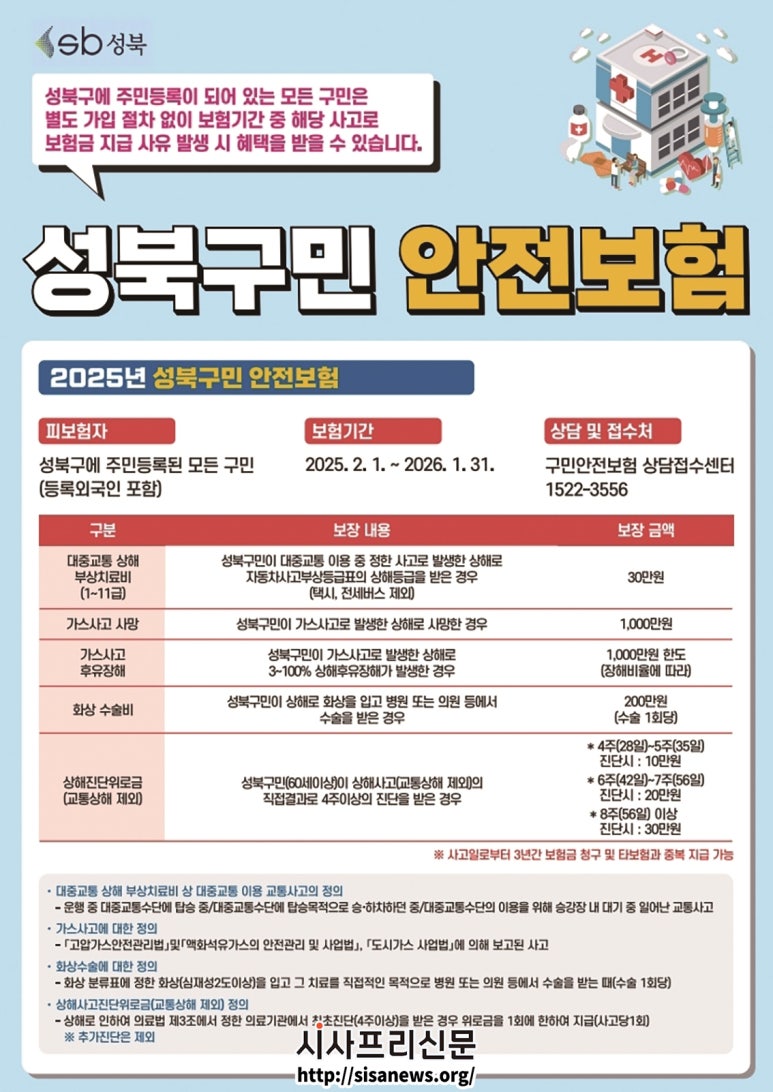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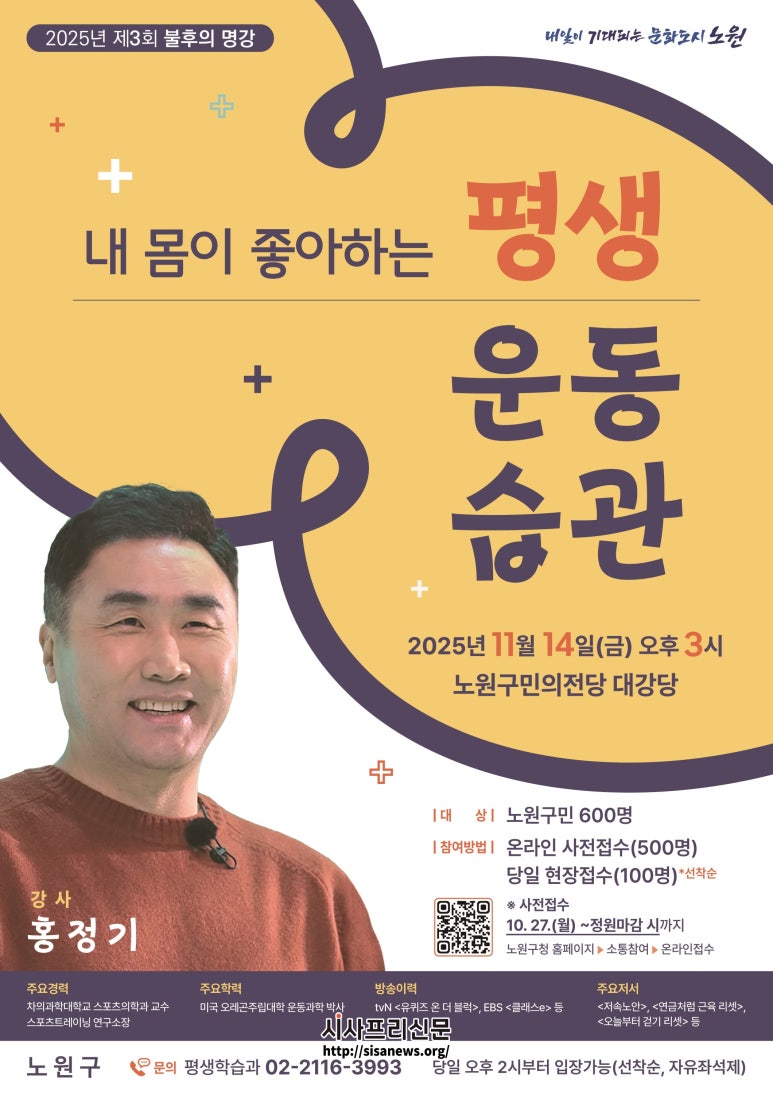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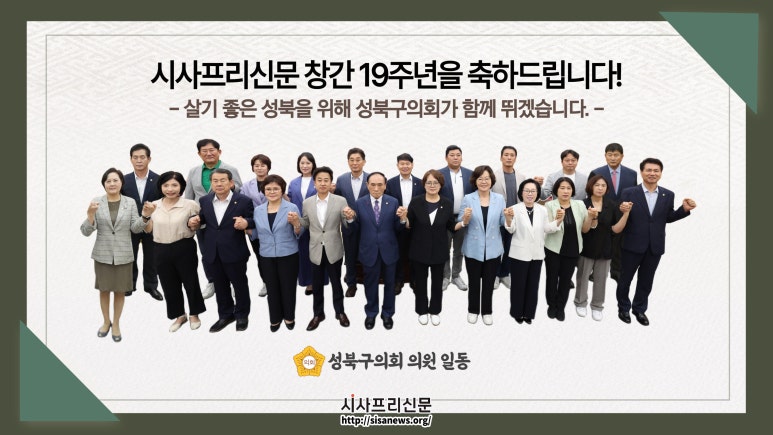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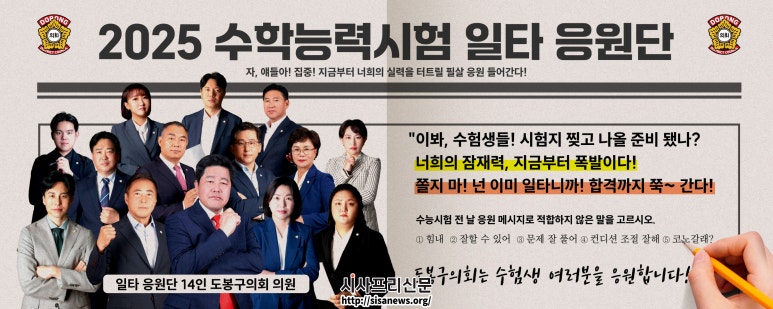




.jpg?type=w7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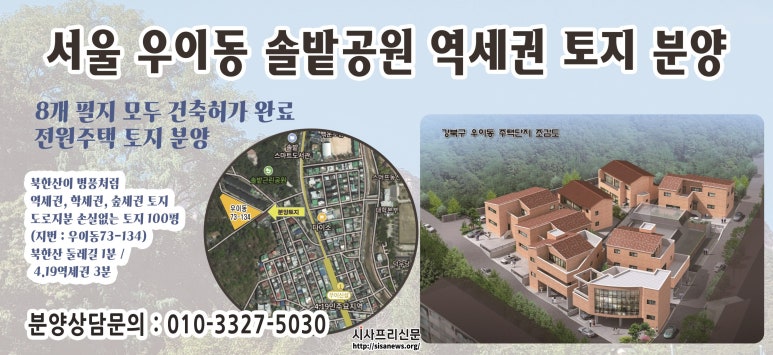
.jpg?type=w773)

